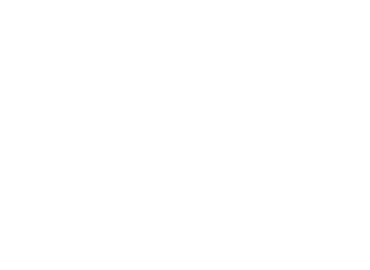김기화 시인의 詩 독백 외 4편

김 기 화 시인의 약력
-충북 청주 출생
-2010 년 시에 봄호 등단
-시집 『아메바의 춤』
-시에 문학회 회원
독백
혼자 중얼거리는 일이 늘어났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면서부터 나는 없다
곁에 공존하는 것들과 날마다 수다스러워진다
대상은 늘 옮겨다니며 말을 건넨다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라고 또 중얼거린다
안부인 듯 폐부를 비집고 들어오는 바람
그 바람에 묻어 온 푸른 안부를 마중하여
또 중얼거린다 , 천국이 거기 있다고
또 하루 나를 읽어내는 건 바깥이라고
간밤을 털어내며 내 안의 기지개를 켠다
여러 개의 나를 들여다보며 물레질을 한다
계절이 바뀌는 반추의 시간이라 하자
늘 함께 하면서 또 혼자인 시간들
길 위에서 나를 묻고 나를 대답하는 것이다
흩어졌다 다시 모이고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아침의 경전에 고해성사가 차려 진다
또 혼자 중얼거린다 , 함께 가는 몸부림으로
물레야물레야 제 몸을 돌아치는 물레야
아메바의 춤
여우의 눈물로 태어난 탓인지 그녀는
줄곧 꼬물거리며 배밀이에 빠져 있다
독하고 치열한 돌기 (突起 )를 반복하다가
가끔씩 흔적 없이 소멸되기도 하지만
육신으로 바닥을 기는 하등의 몸부림이었다
깃털을 세운 파도가 하얗게 와 닿은
뱃고동 기슭엔 바다의 나이가 물금져 있다
바람과 파도가 만난 시간의 갈피에
그녀가 푸르게 갈긴 육필원고가 출렁거렸다
해물해물 그녀만의 섬을 질퍽거리는 오후
둥둥 수많은 무생물과 생물의 불시착으로
포구마다 뱃머리마다 산란된 필적
차마 새길 수 없는 해감된 수면의 침묵을 보라
뗏밥처럼 붙어있는 직립형 아메바들은
거대한 바다의 물길에 하찮은 비린내 풍겼던가
언제든 뒤엎을 수 있는 해면에 입질을 해대는
저공의 갈매기 한 마리가 날개를 헤적인다
밀물과 썰물의 육감적인 생을 사는 그들의 방식
물보라 속을 떠도는 바람의 깃을 세워본다
현미경 속에서 만난 알몸 춤사위는
그녀가 살아내야 하는 바다였으리라
별빛 충전소
별빛 충전소를 아시나요 ?
기억 속의 유년은 늘 반짝거렸어요
신비한 동화를 내건 하늘의 은하
나는 수시로 별꽃을 수신했지요
무료로 쏟아지는 천국의 별빛 사용권
지상에 없는 별이 내려오는 별창이지요
별빛 충전소를 올려다 본 적 있나요 ?
아플 땐 별을 물고 잠들었어요
엄마 별 내 별 이름표를 붙여놓고
밤하늘 저편 아이와 함께 자랐어요
승차권이 없어도 성좌에 입궁을 했지요
하늘 소유권을 행사할 사람도 없어
수시로 여닫을 수 있는 별궁이었지요
총총 대문이 없는 하늘에 사는 그대여
그곳 빛나는 별밭 속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나도 지상의 별일까요
성곽에 들다
그곳에는
말하지 않는 순례자가 있다
절개라는 외벽으로 서 있는 소나무
나는 숲의 궁전에 들어 숙연해지려 한다
하루가 빛으로 열리는 숲속의 시간
날갯죽지를 털어 날개맥을 펼치는 새
수런수런 발꿈치가 바지런해진다
바람은 함부로 성벽을 헐지 않는다
말하지 못하고 울지 못한 바람길
수없이 풍장 되었을 저 구름길
옛사람들의 견고한 숨을 읽는다
담장 너머 구릉진 단단한 역사
마른 나뭇잎들이 낮은 골짜기로 모여든다
나는 가능한 눈으로 말하려 한다
무심히 잠겨있는 작은 철문 앞에서
어제의 그를 만난 듯 성곽지기가 되어 본다
말문을 트지 못한 체 내려왔던 기억
둘레둘레 만월이 따라오던 그날
인간식물
식물인간이라는 명명에 내 귀는 점점 나팔꽃이 되어 갔어요 내 존재 따위는 이미 미물로 고착된 지 오래죠 툭툭 불거진 푸른 넝쿨의 하얀 링거는 그저 생명연장선에 불과했어요 토악질을 해댔죠 사지를 포박한 의학용어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대화창이었으니까요 그들의 호의적 병상일지는 의무방어전일 뿐 내 나팔꽃 귀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그래요 난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식물로 불러주세요 침대를 잠식한 내 몸을 리모컨이 쏴 주면 감전되듯 파장을 일으켰어요 비록 내 의지로 직립보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뚜둑 관절이 꺾일 때마다 뼈마디는 피리소리를 냈어요 코끼리 같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는 회진 중이라는 말이지요 그들 앞에서 내 다리는 허공에 대고 헛발질만 했어요 귀청을 뚫고 간 그들만의 언어가 비수처럼 들려요 내 몸은 아직 살아있어요 묵비권을 행사 중 인거죠 식물인간이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내 육신을 나팔관들이 붉게붉게 지키고 있어요 꽃이라고 불러달라는 거 아니예요 온몸이 아픈 걸 여전히 알아요 마디마디 나팔을 불고 싶을 뿐 아직은 인간식물 , 듣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