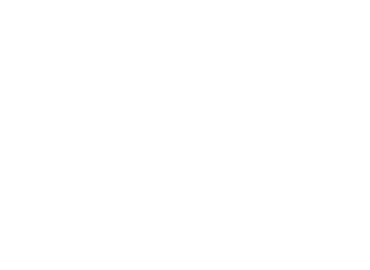한옥순시인의 詩 벚나무 벚나무 외 4편

한옥순시인 약력
동두천 출생.
2000년 『문학세계』등단
-시집:『황금빛 주단』(2011. 원애드)
벚나무 벗나무
벚나무 아래 할머니 둘이 나란히 앉아 있네
벚나무도 할머니도 서로 서로 벗이 되어주네
벚나무 벗나무 서로 마중하던 때가 엊그제네
봄 가랑비에 벚꽃잎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네
파르랑 파르랑 파르랑 날아가며 흩어지네
봄앓이 하던 할머니 벗 하나 세상 떠난다 하네
벚나무도 벗나무도 서로서로 배웅할 차비를 하네
벚나무 아래 솔기 해진 손수건 한 장 찬 땅에 누웠네
흰 꽃잎 닮은 나비 한 마리 날아가는 걸 무심히 보네
벚꽃도 벗꽃도 좋은 곳으로 가고 있으려나 생각하네
벚나무도 벗나무도 서로 서로 그렁그렁 글썽이네
꿈꾸는 운동화
진초록색 나무 대문 옆에 까만 운동화 한 켤레 가지런히 있습니다
양 팔을 벌리고 있는 대문에서부터 마루까지 발자국들이 웅성입니다
대문 기둥에 걸어 놓은 새집 닮은 弔燈에 봄 석양이 닿아 있습니다
여린 불빛은 골목을 따라 주황색 걸음으로 어룽어룽 비추며 갑니다
오늘 새벽, 운동화 주인이 영영 먼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메고 다니던 가방을 그대로 둔 채 혼자서 떠났다고 합니다
보온병과 수첩과 볼펜 그리고 속없이 착한 친구 같다던 허름한 운동화,
운동화 바닥에 덕지덕지 묻은 둘만의 고단함을 어떻게 두고 갔을지
먼지 같은 미련 하나라도 두고 가는 건 아닌지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길을 걷다 잠시 앉아 쉬던 틈에 써 두었나봅니다
‘친구야, 어쩐지 오늘이 내 마지막 희망일 것 같아
어느 날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게 된다면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아
만약에 말이야 한번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면 그때는
바람이 되고 싶어
구름이 되고 싶어
그때도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수첩 맨 마지막장에 써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난 이름과 조등 아래 가지런하게 누운 운동화가 닮았습니다
세상을 걷는 동안 만났던 풍경의 기억들을 하나씩 외우다 갔는지
다문 표정이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서로의 生이 너무도 닮은 운동화 속 가득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연민을 단숨에 읽어 낼 수는 없겠지요
단숨에 잊을 수도 없겠지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즐거운 나의 집
늙은 나의 집에서 늙은 라디오를 켜고
늙은 찻잔에 담긴 커피를 마시네
늙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고 늙은 둥이도 있는 내 집엔
늙어 허리가 휜 빨래걸이에 걸린 늙은 수건들과
양말과 런닝구와 행주가 졸고 있는 풍경이
새삼스럽게 정겨워 보이네
화분에서 늙도록 살고 있는 화초들이
눈물겨웁게 대견하고
늙어 삐걱거리는 싱크대도 정겹고
늙었던 어머니 잇새처럼 벌어진 창문 틈으로
기어코 들어오는 새초롬한 가을 햇살이 고맙네
뿌옇게 바래 백내장 앓고 있는 눈동자 같은
늙은 거울로 보이는 이제 막 늙기 시작하는
내 모습이 예뻐 보이는 집,
늙은이와 늙은 것만 남은 이 집은
즐거운 나의 집이네
늙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창밖을 보고 있네
세상에서 내가 제일 팔자 좋은 늙은 사람 같네
이 모든 게 꿈만 같네
암만해도 꿈만 같으네
꿈, 만, 같, 네,
늙어 늙어가는 내가 그래도 꾸는 꿈은
늙은 시계를 차고 늙은 남편과 늙은 둥이와
해소기침을 뱉어내는 늙은 애마 산타모를 타고
느릿느릿한 속도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것이네
꿈결 같은 드라이브를,
먼 곳에서 온 그의 이름은,
아주 먼먼 북쪽에서 왔다고 했다
바람에 실려 왔다는 말도 들었다
조금은 마른 몸에 키가 크다고 했다
무덤덤한 표정이지만 생각이 깊어 보이는 인상이라 했다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희끗하게 색이 바랜 얇은 외투가 전부라고 했다
왠지 조용히 불러야 할 것 같은 그의 이름은,
푸르던 한 시절, 기억 끄트머리만큼이나 먼데 사는 사람이 있었다
눈 내리는 겨울밤 호롱불 앞에 마주 앉아 백석의 시를 읽어보는 게 소망이라며
희미하게 적힌 주소와 나무껍질에 꾹꾹 눌러 쓴 편지를 보내오던 사람이 있었다
자작자작 마음 타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다던 사람, 어디선가 스쳤던,
그때 그 옛사람을 닮았을 것 같은 나무 한 그루를 떠올려 보는 눈 내리는 겨울밤
멀고 먼 나라로 이어질 것 같은 지도책을 펼쳐 놓고 손끝으로 걸어보다
며칠째 불어대던 눈보라가 그치면 찾아 나서야겠다고 생각 한다
옛사람이 한참 머물렀다고 하는, 썼다가 지웠다 다시 썼다 지운 흔적 같은
강원도 깊은 산 어디쯤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당신,. 아직도 거기 있나요?
꽃나무 日記
고요함이 깊어가는 겨울마당 한켠에
아주 오래된 시집 같은 배롱나무 한 그루가
맨 몸 채로 눈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가지마다 눈송이를 흰 꽃송이처럼 달고는
버거운지 고개를 조금 숙이고
제 발등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더니 눈 덮인 발치에다
휘파람소리로 입김을 불어
文字를 만들어갑니다
그 모양새가 꽃나무의 日記 같기도 하고
어딘가로 보내는 편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봄이 오려면 아직 한참이나 먼 것 같은데
어쩐지 올 겨울은 유난히도
발등이 너무 시리다고
첫 줄에 씌어있더니
꽃 진 자리가 아릿한 것 같다고
꽃 필 자리가 자꾸만 간지럽다고
마지막 줄에 적어 놓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가려니
쓸쓸하고 또 쓸쓸한 넋두리인양
적막하기가 참 그지없습니다
언제 왔는지 그림자나무 하나가
꽃나무 곁에 살그머니 와 섭니다
꽃이 피어도 꽃이 져도
꽃나무는 꽃나무입니다
홀로 서 있어도 꽃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