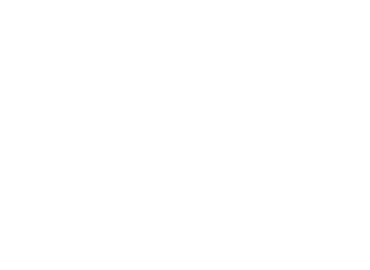서주영 시인의 약력
충남 아산출생
2009년 『미네르바』로 등단.
시집 『나를 디자인하다』가 있음.
모란시장의 봄
모란시장에 장 구경을 갔다
내장을 훅 뒤집는 역한 비린내가
먼저 달려든다
철장마다 한데 갇힌
수십 개의 눈망울에
쓸쓸한 봄비처럼 마음이 젖는다
마치 상품마냥 비슷한 덩치로
사각의 비좁은 철장에 갇힌
낙심한 눈망울이 초침처럼 불안하다
철장 안, 형제와 친구들을 바라보다가
주인의 눈치를 살피다가
코 앞,
어둠속으로 끌려 나가는 그들
널브러진 주검을 보면서도
무자비한 인간의 손길이 두려워 울지도 못한다
친구를 따라 들어선 시장 입구
몇 걸음 못 가 뒤돌아서고 말았다
들뜬 마음이
바닥으로 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버스까지 따라온 슬픈 눈망울들이
함께 버스에 오른다
하필, 충혈 된 개들의 눈알 같은 벚꽃잎이
봄비에 아무렇게나 흩어지고 있었다
일력
무화과나무 앞에 서면
치장을 모르는
엄마의 하루가 보인다
모든 것을 안으로 안으로
묵묵히 담아내는
손가락 마디마다 옹이 박힌
오롯이 빈손의 엄마가
무화과나무 앞에 서면
상처가 덜 아문 뭉툭한 무릎을
주렁주렁 매단 채 버티는
덤덤한 표정의 엄마가 보인다
가슴을 가르면
혈관마다 벌건 슬픔으로 차 있는
그래서 無花果는 無火果
안으로 화를 담고도
적막한 시간을 묵묵히 건너온
또한 無花果는 無化果
상처도 눈물도
아예 없었던 일처럼 늘 고요한
바닥이란 말
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본다
바닥은 끝이 아니다
반환점을 돌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다
바닥이란 말,
바다의 맨 밑바닥을 ㄱ자로 몸 굽혀 받치고 있다
허리 한 번 못 편 채 안간힘 다해 사는 바닥,
바닥이란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말이다
기름 유출사고에
악취를 뒤집어쓰고 바닥에 붙들린 바닷새들,
살아남기 위해 부리로 제 깃털을 몽땅 뽑거나
무거워진 날개의 반을 뭉텅뭉텅 쪼아 잘라낸다
갈가리 찢긴 마음은 날개도 깃털도 없는 울음이다
날아다니는 바닥이다
그늘꽃
바닥 밑의 바닥엔 키 작은 네가 있다
저항도 눈물도 잊은
웅크린 너의 목소리를 건져 올린다
눈 귀도 닫아버려 음습한 이력
외줄 타는 어름사니처럼
일제히 소리 죽여 아슬아슬 어둠을 건너느라
한낮도 후미진 밤이었다
숙성된 어둠에게 할퀴고 물어뜯기며
맨살로 오롯이 버텨온 너를
묵묵한 한 떨기 시인이라 부른다
산속의 헌책방
꼬불꼬불 찾아간 숲속 한가운데엔
책이 사람을 기다리는 새한서점*이 있다
퀴퀴한 냄새를 다정하게 움켜쥔 산골 헌책방,
이곳엔 이 빠지고 머리 벗겨진 채
십 년간 책방을 지켜온 사내가 있다
박쥐며 산새들이 진열된 책 위에 알을 품으면
그 밑의 책은 주문이 들어와도 품절이다
책꽂이 여기저기 집짓는 새들
이 숲은 거대한 한 권의 책이다
제비꽃 진달래 할미꽃 애기똥풀은 서문이고
본문은 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산딸나무 팥배나무가 차지했다
행간 사이로 새들의 노래가 날고
오솔길은 퇴고를 기다리는 문장이다
수없이 읽고 간 흔적들
각주도 없이 읽어나가는 숲
출간된 지 오래된 이 책은
고라니 노루가 제일 좋은 단골이다
봄이면 신간을 선보이는
이 숲의 저자는 아직도 집필 중이다
진열된 책 위에 박쥐며 산새들이 집을 올리고 알을 품으면
그 밑에 책은 주문이 들어와도 품절이다
*충북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에 있는 숲속의 헌책방. 책 많은 인터넷서점으로 알려진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