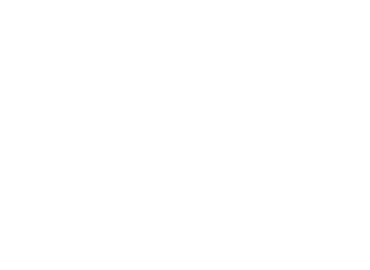조광자시인의 약력
경남 함안 출생
2009년 (시와산문) 신인상으로 등단
시원문학회, 시의밭, 동인.
시집 [닿을 수 없는 슬픔에게]
산다는 것
느릿느릿 되새김질하는 강
가는지 오는지 깊은 속을 보이지 않는다
밀림 한 가운데서
사자에게 먹히고 있는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의 눈이 저랬다
온통, 검푸른 동공뿐이었다
칼과 숫돌 사이
벼리고 깎아서
서로에게 필요한 연장이 만들어지듯
무딘 칼날은 숫돌을 깎아내리고서야
날을 세우고 시퍼런 위엄을 갖춘다
거품을 물고 흘러내리는
예리한 눈빛
상처를 파헤치듯 돌아눕는
싸늘한 금속의 차가움이여
서로에게 익숙해질수록
제 몸을 깎아 완벽한 짝으로 태어나는
칼과 숫돌 사이처럼
무뎌지고 뭉텅한 마음을 벼리고 산다
분수
욱, 하는 심지 한번 잘못 건드리면
위로 치솟는 폭포가 있다
붉은 화염을 두르고
쏜살 같이 허공을 찌르는
물줄기 하나 키우고 산다
누군가 들려주는 장단에 맞춰
움찔움찔 어깨춤도 추는
꼭두각시가 내 안에 있다
한 편의 드라마에 울고 웃는다
답장
내 곁에 머무는 난(蘭)의 가슴에
사랑의 연서를 보냈는데
추운 겨울에 가느다란 대궁을 밀어 올리더니
하얀 별꽃을 매달아 놓았다
사랑이 별을 달고 왔다
지상으로 내려온 별들이 어두운 방안을 환하게 피웠다
추신으로, 향기까지 덧붙였다
휘어지다
평생을 뒤척이며 허리가 뒤틀렸다
꼬인 근육이 견디는 통증이 깊어지면
옹이 진 마음도 같이 자란다
꼿꼿하게 세우지 못한 허리에
누군가는 손을 얹고
더러는 비웃고 지나쳤을 그 길
기꺼이 고개를 숙이거나
에돌아가야 하는 기울어진 허방에
왜,
굵은 성깔의 가지 하나 키우지 못했는지
한 줌의 주먹도 스스로 내지르지 못했는지
그 마음 순하게 풀다 보면
해마다 푸름이 더해진다고
우듬지도 무성하여 바람막이가 된다고
짓무른 눈가를 문지르며 바라보시던 어머니
그 말씀이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여름 한 철 자갈밭에 묻혀 산다
갈라진 맨발을 딛고 일어선 바람이 산을 넘어가는 소리
허물어진 마음이 봉긋해지도록 다독이는 소리
비탈진 길에 휘어진 소나무 한그루
그만 쉬었다 가라고 구부러진 허리를 내민다
차마 앉을 수가 없어 돌아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