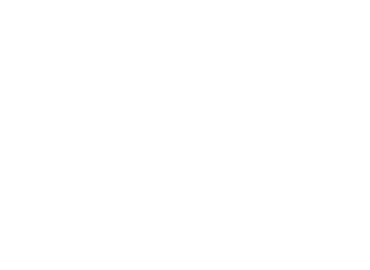김민채시인의 약력
전북 고창출생, 〈시문학〉 등단
제 18회 푸른시학상 수상, 2022년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시집『빗변에 서다』 ,『노랑으로 미끄러져 보라』 가 있음
심장이 틱톡 틱톡
광대가 있어
하루를 건널 때마다 메롱거리는 비웃음에
쪼그라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둘러치고 엎치고
짧은 말로 흥정하는 것도 척척, 심장이 쿵쾅거려
그냥 가던 길이나 가는 게 좋아
화초나 옮겨 심고
바닥 청소하고 밥 짓는 것도
나는 손만 커지고
광대는 입만 벌어지고
나보다 앞서 입이 튀어 나가면 까르르 지갑을 여는 손들, 나는 가만히 뒤에 숨어 웃기만 하면 돼 리뷰 리뷰, 도돌이표에 어지럼증이 걸릴 것 같아
공중에 매달린 틸란이 가쁜 숨을 쉬고
호름밴세가 퍼즐을 달그락거리면 베고니아 다초점 렌즈가 흔들려
노래진 하늘, 터벅터벅 광대의 말이 걸어오는 소리,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어
파김치 된 오후가 씩씩거리고
광대는 내 어깨에 걸터앉아 잠들었어
우울이 전등갓에 매달려 틱톡 틱톡
누군가
나의 하루를 마감하고 있어
앵두나무 집
낙수落水가 차올라 귓바퀴까지 찰랑찰랑
기다리는 것들은 미루나무 잎 사이를 뜀뛰기 하며 반짝이지
시냇물 소리가 졸졸 귀에 넘치면
삘기가 익어가고 까마중이 익어가고 파리똥이 익어가고
그 소리, 나를 얼마나 멀리로 데리고 가는지
앵두나무에 피던 여름이 가면
봉숭아 물 들인 손톱 으로 첫눈을 점쳤지
매산리 864번지
그리움은 바닷가 조약돌 소리
차르르 차르르
썰물 때만 내는
잠시 시들어라*,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가 들린다
문단속은 했는지 가스는 껐는지 수돗물은 잠갔는지 걱정 많은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그 집
다시, 앵두꽃 피었다
*‘한숨 자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화자의 어머니가 자주 사용한 말
발랑리를 달리고 있어요
그는 내 눈 속에서 자신을 보려고
가끔,
나를 한 입 베어 물고 나이 먹은 게 아직도 덜 여물었다 핀잔을 주기도 해요 저녁나절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그는 광명에 있고 나는 파주 발랑리를 달리고 있어요 팔랑팔랑 치마를 펄럭이며 분홍으로 물들고 싶은 날, 날마다 분홍이고 싶었지만 붉거나 노랑으로 미끄러져 보라로 끝나기 일쑤죠
한때,
그의 눈에 갇히고 싶어 안달했지만, 갇히면 견딜 수 없는 파랑새였어요 난, 익숙해진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예요 그의 호흡이 발랑리까지 달려오는 것처럼요 내 입이 완곡어법을 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네요 그걸 뚝심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젠,
그에게 난 여자가 아니에요 그는 늘 내 밖에서 나를 찾아요 광명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미 나를 벗어났거든요 대리의 시간을 기꺼이 져 주던 우리의 분홍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발랑리를 시식 중입니다 무슨 맛일까 닥치는 대로 달려드는 내가 너무 신나요
잠실
잠실에 간다
빗소리 같은,
시간을 갉아먹는 초침 소리 아삭아삭 맛있는
초록 물 뚝뚝 떨어지면
아이들은 손톱에 검은 물이 들어서
누에처럼 여물어 갔다
뽕잎을 따고 뽕잎을 나르고
뽕잎을 먹이던 순환 회로에 불이 켜질 때에야 나는
뽕잎을 덖었다
제대로 된, 따끈한 맛 네댓 번 보여주면 기죽을까
불 속에서 연단 받는 풀잎, 여린 풀잎들
지하철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날 때
굴을 뚫고 굴을 빠져나올 때
귀 닫고 눈 감고 스스로를 가두는
잠실의 풍경 속 깊은 잠
저마다 둥근 집을 짓고 마지막으로 천문을 닫아야
하늘과 내통한다는데
달빛 들어 올리는 소리에 쿨럭, 잠실이 흔들린다
할머니는 밤새 실을 뽑고
날개를 달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가고 몰려오는 잠실역 4번 출구
달 바깥으로 손을 뻗은 아이들이
제 이름을 버리고 뜀박질하는 소리 들린다
오두개가 익어간다
풍경
처마 밑 황동 금붕어
물 한 모금 못 먹어도
바람 데리고 잘 놀더니
오늘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꽃들도 무슨 일인가
몸 낮추고
바람은 더 아래로 허리 숙이는데
생각 깊어진 금붕어 눈에
달빛이
한 자반이나 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