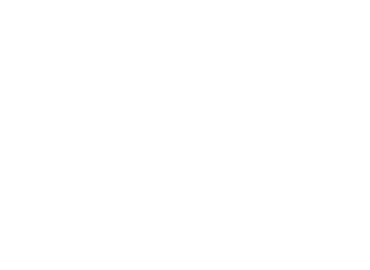이현서 시인의 詩 바람의 향기를 품다 외 4편

이현서시인 약력
경북 청도 출생.
2009년 『미네르바』로 등단.
시집 『구름무늬 경첩을 열다』
제4회 박종화문학상 수상.
바람의 향기를 품다
눈물도 오래 가두면 꽃이 된다. 겨울
물병자리 남자가 무릎을 꿇는 시간, 바람은 분주히 시침을 돌리고
눈보라들은 사스레나무 숲으로 갔다 흰 수피의 나무들 몸속 심지를 돋운다
전생을 건너온 순백의 영혼들
속수무책 등고선을 오르는 술렁임의 난청 속에서도 먼 우주 밖 소리에 귀를 세우며
이름 모를 성좌의 기원을 짚어가고 있다
지금은 휘몰아치던 소용돌이를 잠재운 채
살얼음 진 허공의 음계를 밟고 꽃으로 돌아가는 시간
유목의 피들이 고요의 주술을 걸며 도드라진 잎맥을 새긴다
수직의 벼랑을 세워 만든 울음의 방
촉수 낮은 불빛을 따라
오래 떠돌던 그리움이 귀가한다
숭어리숭어리 환한 이마를 가진 당신
툭툭 끊어진 길 위로
아슴아슴 잎맥을 타고 오는 날숨은 그대를 향한 슬픈 고백이어서
그 나라에 닿기도 전에 속절없이 사라지는 운명이지만
나는 또 비탈길에서
우듬지 마다 시린 바람의 향기를 품는다
동공에 스민 눈물 한 점으로
비가 사막을 건너는 동안
다시 수면이 반짝이네
희고 단단한 사리를 품은 갑골문이 마법을 푸는 우기
참방참방 지느러미를 흔들며 우주를 낳네
수면위에 맺힌 상像들이 중심을 껴안으며
억겁의 시간이 문을 여네
수수만 년 잠든 기억을 더듬어
가만히 말을 걸어오는 우유니 소금평원*
몸의 소용돌이를 안은 채 흰 구름이 지나가네
먼 지평선 밖으로 두 개의 태양이 지네
빛의 결가부좌위로
수많은 별자리들 첨벙첨벙 다가오네
얼음감옥에 갇혔던 슬픈 연대기를 거슬러 오르면
차고 푸른 바다가 있었네
조금씩 푸른바다를 메웠던 단단한 침묵 속
깊은 잠을 깨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뚝 끊어진 물길 어디쯤 쓰다듬고 있을까
파랑을 품었던 물결무늬가 심해어처럼 살아오네
우기가 펼쳐든 신의 늑골 속 통점들이 환했네
길은 언제나 허공으로 뻗어 있다
나무는 새의 울음으로 자란다
수피에 새겨진 새들의 울음으로 나이테가 자라고
몸속 깊이 감았던 환한 숨 풀어내면
붉은 공명음으로 잎맥이 천천히 아가미를 닫는 둥근 시간
소리의 길을 따라가면 새의 연한 부리가 있다
처음 소리가 시작된 곳, 어미의 심장 소리가 만져진다
지난밤 저온의 온도를 매단 가지마다
낮은 시간 쪽으로 풀어낸 행간 속에는
길 밖으로 걸어 나간 자의 영혼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무성한 소문처럼 기울어진 어깨 위로 쏟아지는 음계들 사이
발치에는 수북이 엎질러진 난해한 물음들
언젠가 새가 되어 날아갈 꿈을 꾸는
혹한의 거리, 모퉁이를 돌아온 종종걸음의 사람들
붉은 노을을 등에 업고
꿈과 공허가 밀착된 하루를 건너고 있다
우두커니 골목 끝 어깨를 내어주는 나무
조금씩 불안을 파먹으며 매달린 어제가 휘청거린다
그래도 길을 잃으면 안 된다고 일찍 나온 개밥바라기별이
끝없이 밀려오는 뿌연 미세먼지를 헤치고 수신호를 보내고 있다
길은 언제나 허공으로 뻗어 있다
안개도시
밤이면 해안선을 따라
바다는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발자국도 없이 밤을 건너는 샤먼의 영혼처럼
내밀한 비의를 감춘 습문들
출렁이는 마음의 장력이 허공을 거느립니다
흔적을 지우며 먼 곳에서 흘러왔을 물의 입자들이
때늦은 고백처럼
난해한 문장 속에서 울음을 꺼내면
밀입국한 후생이 삐걱 문을 열고
젖은 몸의 기척들이 자욱한 밤을 건너갑니다
우르르 지하로 몰려든 사람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눈먼 자들의 도시*로 이주 합니다
창백한 시선들이 수묵의 농담濃淡으로
몸속에 그림자를 가둡니다
습곡마다 달의 궤도를 이탈한 소리들을 만지며
혼자 우는 밤, 집요하게
젖은 영혼들이 서로에게 잊혀져가는 늪
파란 정맥을 타고 흐르던 연민이
어둠속에 풍장 되고 있습니다
그립다는 말
‘그립다’는 카톡이 날아들었다
쨍그랑, 수면이 깨지는 소리
벼랑을 타던 빼곡한 우울이 걷히고
파란 하늘이 내려오는
아무도 모르게 순장했던 빛들이 붉은 심장을 열고
맨발로 살아 돌아오는 길목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예감
젖은 문장을 꼭 움켜쥔 꽃잎들이
천 만평 꽃차례로 휘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