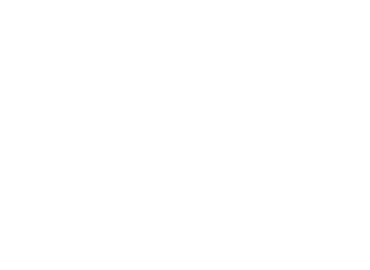이원숙 시인의 詩 통조림 외 4편

이원숙 시인 약력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나 숙명여대를 졸업했다.
2016년 <미네르바> 신인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거미학자와의 인터뷰』가 있다.
통조림
아침은 간단히 먹자
유리그릇에 콩을 부으며 그가 말한다
원재료명 강낭콩 정제수 설탕 토마토퓌레 유통기한 3년……
라벨 뒷면을 읽던 그가
먹다 만 콩을 남겨둔 채 일어선다
등 뒤로 쿵, 닫히는 현관문
든든한 철문이 지키는 사각의 콘크리트 철옹성에서
둘이 백 년은 끄떡없을 거라던 그는
아침이면 일어나 집을 나간다
나는 문 안에
그는 문 밖에
버리고 온 햇살과 바람을 쐬러 가는 것일까
한 알의 품질 좋은 통조림이 되려고
캄캄한 양철통에 들어간 강낭콩만 같아져서
자정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문 밖의 사람
유통기한이 다하기도 전에
우리의 침실에선 벌써 쉰내가 풍긴다
라벨을 마저 읽는다
―개봉 후에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드십시오
먹다 남은 강낭콩이 개수대에서 썩기 시작했다
가방의 안쪽
짐 가방을 끌어당긴다 등짐이 무거워 버팅기고 선 노새처럼 가방은 꿈쩍을 않는다 짐이래야 며칠간의 휴가를 위한 여벌옷이 전부인데 이상해,
가방을 열자 할머니가 걸어나온다 나 어릴 적 죽은 할머니는 한쪽 무르팍을 세우고 앉아 풀 먹인 베옷을 만지작거린다 얘야, 너는 조금도 자라질 않았구나
백동반지 낀 손을 들어 내 이맛머리를 쓸어 올린다 그러고는 베옷을 툭툭 털어 펼쳐 보인다 이태 전 아버지가 입고 간 바로 그 옷,
네 애비 걱정은 말거라
눈앞에 삼베가 누렇게 펄럭거린다 바람도 없는데 마구 펄럭거린다 문득 창밖이 어둑해지고 빗방울이 날리기 시작한다 빈 유리창에 무수한 사선이 그어지더니 화살이 되어 동공으로 날아든다
눈앞이 흐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가방이 무거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서
할머니를 따라 가방 속으로 들어갔다
깊고 서늘한 가방의 안쪽, 가방이 나를 들고 갔다
샛강역
스크린도어가 열리자 오래 서성이던 발들이 황색 선을 넘는다 발밑에 스멀거리는 검은 기류를 몰아내려 조명등은 눈을 부릅뜨지만, 이곳의 어둠은 도무지 불사신이다 기피제를 뿌리면 물러났다가도 다시 달려드는 모기 떼만큼 끈질긴 것, 배후를 알 수 없는 저 컴컴한 것은 그러나, 낯이 익다
전동차가 끌고 온 길은 일직선이다 낮의 입구에서 밤의 출구까지 꺾이지 않는 외길, 말랑한 어둠이 양갱처럼 갱도를 검게 채운다 암흑이 흘러드는 샛강역에는 희끗한 별들의 주검이 떠내려온다 죽어가는 별들은 빨간 눈알을 깜빡이며 갱도 속 어둠을 핥는다
자외선 소독기 속 컵들처럼 빼곡히 들어찬 승객들은 지루한 장기수처럼 남은 시간을 질겅거린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을 흘깃거리며 지상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한다 깜깜한 절벽에 몸을 던지며 전동차는 달린다 땅속에서 헤매는 일생, 길게 드러누운 묘혈에서 벌떡 일어나 앞을 가로막는 검은 덩어리
선로 옆 붉은 눈동자들 차창에 들러붙어 내부를 들여다본다 당신은 지금 어둠의 몸속을 통과하고 있다 단말마를 내지르며 별들이 선로 위에 떨어진다 문득, 빛에 머물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이름이 떠오르고 내 안에서 작은 불가사리 한 마리 요동친다 어릴 적 상심해 죽은 별이라고 한다
숨바꼭질
한 달을 누워만 있던 아버지
어린아이가 되었나, 숨바꼭질 하자시네
탯줄같이 휘늘어진 링거 줄 떼버리고
흰 시트 속으로 엇, 숨어버렸네
술래만 술래만 하던 아버지
이번에는 나더러 술래 하라시네
아버지는 나빴다,
눈 가리고 열까지 다 세지도 않았는데
이제 숨어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디 잡아볼 테면 잡아보라며
하늘공원 화장장 불 속으로 뛰어들었네
저기 저 흰 뼈가 아버지일 리 없지
고개 갸우뚱거리는 사이에
백자 단지 속으로 재빨리 숨어들었네
하얗게 센 머리칼도 헐거운 옷자락도 보이지 않지만
앞세운 커다란 영정 사진
아버진 줄 다 알아
찾았다 빨리 나와요, 소리치자
한 줌 뼛가루로 변신한 내 아버지
머리 긁적긁적 계면쩍은 웃음 흘리며
솔솔솔, 한지 꾸러미 속에서 빠져나와
섬잣나무 그늘 밑 깊은 구덩이에
영영 숨어버렸네
소 들어오는 날
정육점 유리문에 큼지막한 빨간 글씨
‘오늘은 소 들어오는 날’
마장동을 빠져나온 소의 나신이 쇠고리에 매달려 있다
두 눈 껌벅이며 살아 있던 소는
뿔도 털도 뺏기고 내장 다 쏟아내고
죽지 않으려던 발버둥도 놓아버렸다
목장갑 낀 사내가 뼈에 붙은 살을 부지런히 발라낸다
삶의 역한 냄새가 장갑에 들러붙는다
한낮의 산부인과 진료실
의사가 돌아앉아 자판을 두드린다
난, 관, 포함, 난, 소, 자, 궁……
주문받은 품목을 꼼꼼히 입력한다
메스를 쥐고 내 복부를 가르고 내장을 뒤적이게 될
그는 전문가, 나는 의뢰인
그와 나는
무영등 불빛 아래 가랑이를 벌리고
뻔뻔함을 맡기기로 한 그렇고 그런 사이
‘내일은 풍납동 대형병원 수술실에 늙은 암소가 되어 들어가는 날’
고깃국을 먹어야 속이 든든할 테지
고기 한 근 끊었다
비닐봉지 속 묵직한 소의 식은 살덩이
죽은 소가 뿔을 디밀고 깜깜한 내 삶 속으로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