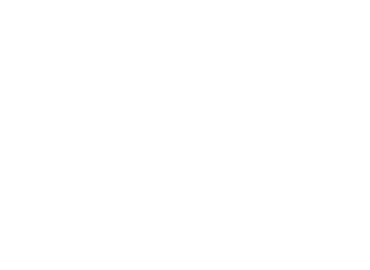온형근시인 약력
1997년 ≪오늘의문학≫
시집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화전』『슬픔이라는 이름의 성역』 『풍경의 분별』
『고라니 고속도로』『천년의 숲에 서 있었네』가 있음.
문화유산조경 박사
한국정원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산벚 순정
내원재에서 백두고원 오르는데 산벚꽃 분분하다.
잎과 꽃이 잠깐 만났다가
꽃잎 흐트러지면서 산화
낱개로 누운 당당한 시선
탱탱하게 맺힌 벚꿀이 활짝 열리고
산벚꽃 싱싱한 꽃잎 포개 날린다.
가지 뻗어 오솔길에 떨어진 꽃잎
아침 햇살 등진 그림자를 사열하듯
길 양쪽으로 아련한 군락으로 도열
탁탁 탁타닥 탁탁타닥 청딱따구리
참나무 연둣빛 새순의 신록이건만
쉴 새 없이 중간 높이의 줄기를
후벼파는 혼절의 안부는 흩날림일까
산벚꽃 낙하를 바람이 거두는걸까
한 그루 장성한 산벚나무 꽃잎 우수수
막 피어나 만개에 이른 조팝나무 위로
연분홍 봄날이 살포시 선계에 든다.
산벚 본류
리기다소나무 울밀도 틈새에 놓인 참철쭉 연분홍 가벼운 흔들림은 잊는다. 산벚나무 가득 원림 능선을 채웠으니 짐 진 사람 등에 꽃향의 봄바람 담겼을까 산벚꽃 휘날리며 저수지로 날아드는 밤중에 등불없이 손 내밀면 바람꽃 한 쪽 가슴 에리게 냅둘까
연초록 잎새가 눈높이 허공을 꼼꼼히 메워가니 그제사 순백의 뭉게구름처럼 봉긋봉긋한 산벚꽃도 오호라 굽은 몸의 선동으로 산자락에 흩뿌려 난리 난장을 치는구나
인적 귀한 산중이라 저 혼차 피우기 적적하여 잎부터 삐죽 내밀고는 천지를 물들이더니 이윽고 너의 꽃도 기력 다 해 버찌 꼭지를 매달았구나
묵은 솔잎
진달래 지고 난 가지마다
묵은 솔잎 촘촘하게 매달렸다.
국수나무 위에는 엎어져 누웠다.
뾰족하여 밑으로 잘 꽂힐 줄 알았는데
아뿔싸,
곧장 잎자루 뭉치를 아래로 향하는 게 아니라
솔잎을 벌려서 비행시간을 바람에 맡기네
걸칠 곳은 다 걸치며 바닥이 아닌 곳에 머문다.
덜꿩나무 꽃 핀 아랫가지에 솔잎 다닥다닥
다리를 세 개나 벌리고 올라탔네
손으로 떼어보는데 제대로 꽂혀 견고하다.
묵은 솔잎 진다고 아주 다 바닥이진 않네
애쓰지 않아도 달라지거나 바뀔 게 없다고
수북정 원림 2023, 봄
낙화암 굽이치는 물결 덧없이 흘러 슬펐을까
자온대로 이끌려 다독이며 흐르는 세월은
고개 들어 멀리 엿본다는 바위섬 위에 수북정 들였으니
어디선들 행장 꾸리는 번잡을 핑계로 머뭇대랴
새벽부터 나서는 내내 백마강 나룻배의 안위를 묻는다.
자온대 복사꽃 휘날려 붉은 꽃잎으로 들뜬 친구
떠돌며 맴도는 드센 강바람 막아 선 움푹 안온한 나룻터로 힐끗댄다.
배에서 내리니 정자 우물마루에 둘러앉은 맑은 웃음 가득해
머언 옛 도읍 사비성 낙화암의 아침노을
고란사의 저녁 종소리까지 왼종일 그대여
나룻배 저어 바위글씨 찾아 춘추대의 찾았으니
사대와 모화慕華 아닌 우월한 자신감
척화와 배척 아닌 문명을 씨앗 삼아
패도에 굽신대지 말고 호혜와 공영을 주체 삼으라 읊는다.
진달래 동산
두 다리 올려놓은지 오래인데
아직도 얼마나 앞뒤로 찢어야 하나
봄 와도 너 없이 산 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태 철봉에 매달려 기지개 펴야 하나
훌라후프는 밤낮으로 돌고
벤치에서 보온병은 수다를 보듬느라 터질 듯 팽팽해
팔은 노 저으며 발은 성큼성큼 내딛는데
진달래 가늘고 긴 혀 모아 내밀고는 활짝 웃네
묘 둥지로 두툼하게 쏟아지는 햇살로, 진달래
오가는 산길에 천진난만 먼저 즐기라는 듯
바람에 픽픽 떨어져 날리는 비행조차
세상에 남아야 피고 진다고, 아직이라 말하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