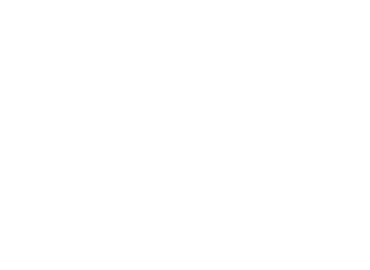홍계숙시인 약력
2017년 <시와반시> 등단.
시집 『모과의 건축학』, 『피스타치오』
머나먼 파프리카
하물며 아프리카 파프리카,
서로 닮았다고 하면 하관下顴이 닮은 거라는데
엄마는 나를 파프리카라고 불렀어요 새파랗게 울고 노랗게 자지러지다 붉게 버둥거리던 어릴 적 나를
아프리카를 떠올리며 캔버스에 파프리카를 그려본 적 있죠
원색은 적도와 가까우니까 물감을 듬뿍 묻혀
꼬박 하루를 물에 담가도 물이 빠지지 않는 色色은 얼마나 덧칠을 해서 태어난 걸까요
아프리카표범이 초원의 노을을 등에 걸치고 붉게 타올라요
빨간 파프리카는 아프리카
싱그러운 초록 곁에 부드러운 노랑, 따뜻한 주황 뒤에 달큼한 빨강
파프리카는 표정이 다양해서
노랑은 봄날의 조언, 주황은 햇살의 깊이, 빨강은 가을의 직언이죠
파프리카는 어쩌면 그토록 선명한 의견을 매달았을까요
달리는 것들은 빨강에서 멈추죠 계절도 절정으로 치달아 가을도 노을도 그 종착지는 파프리카
벌어진 석류도 화살나무 열매도 벚나무 잎새들도
오후를 술에 익사시킨 세렝게티 도마뱀도
태양이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성이는 서쪽
최초의 빛깔을 간직한 아프리카, 죽음은 원색의 깊이에 닿아있고
파프리카를 빠져나온 생각의 꼭지가 가지로 들어가 뿌리로 흘러내려요
하얀 캔버스 위를 달리는 아프리카
파프리카에 도착할 때까지
미니멀 라이프
그녀는 가볍지 않아요
밥 대신 여백을 지어 허기를 채우는 그녀는 무거움을
버리려 해요
여백은 밥을 밀어내요
썰물 때 손가락 첫마디가 쓸려갔지만 싹이 돋고
고통은 금세 잊혀져요 손가락 한 마디만큼 더
가벼워져요
그녀의 허리는 개미처럼 가늘고 개미 등에 실린
짐은 무거워요 무거움을 덜기 위해
썰물이 그늘 뭉치를 서쪽으로 옮겨놓아요
그녀의 눈동자가 빛나요
눈동자는 자꾸만 자라나요 커다란 눈으로 바라보는 바다는
밀어낼 것이 많아요 바다가 쥐고 있는 것을
놓기 위해 썰물은 서둘러야 해요
미술관에서 마릴린 먼로 얼굴을 보았어요 입가에 점 하나만
달랑 남아 있었죠 눈과 코를 지우는 일은
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는 일이에요
뒤통수는 버려선 안 될 수만 가지 이유를 떠올려요
눈물 콧물 쏙 뺀 그녀, 모두들 채우려 할 때
비우려 몸부림을 치다 바다가 되어요
멀리서, 바람과 햇살이 바다를 골고루 나눠가질 때
비로소 그녀는 날개가 되어요
기울어가는 부양
시골 빈집이 할머니를 부양해요
세간살이 뼈들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기울어가는 부양
가끔 앞산에서 날아오는 뻐꾸기소리가
업둥이 딸처럼 다녀가요
쪽마루에 앉아 맛보는 봄볕은 달달한 간식이에요
자고 나면 조금 더 기울어진 흙벽 안쪽에서
할머니는 헐거운 세간이 되어가요
가까스로 빈집에서 벗어난 집은
사람을 놓칠까 걱정이 많아
새벽 일찍 방문을 열어보지요
빈집의 적막은 죽음과 똑같은 무게니까요
휑한 집안에서 느슨한 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세끼 밥 때에요
양은냄비 하나가 먼저 간 아들처럼 살가워요
외로움을 넣고 미움도 끓여 마시면
비어있는 컴컴한 구석을 채울 수 있어요
그토록 마음 기울인 자식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텃밭에 심으면 파릇한 안부가 돋을 거라며
주름진 시간이 호미를 손에 쥐어주네요
빈집은 조였던 관절을 풀어
할머니와 기울기를 맞추곤 해요
오늘은 봄바람이 부양을 하겠다고
한나절 빨랫줄을 흔들다 갔어요
남은 살과 뼈를 빈집에게 나누어 주며
할머니는 조금씩 지워지고 있어요
욕구 하마
너는 하마, 물 먹는 하마 물이 걸린 옷장, 그 하늘 아래 하마 안개 속에 하마 구름 속에 하마 비 내리는
비를 먹는 너는
물오른 하마,
냉장고 속 하마 삼시세끼 하마 신발장 속 하마 입이 떡, 벌어지는 냄새를 신고 걷는 너는
꽃을 먹는 하마 봄을 삼킨 하마
잰걸음으로 달아나는
너는 벌써 하마 순식간에 하마 아이 먹고 어른이 된
나이 먹고 어제가 된
하마 왔니?
기억을 먹는 하마 기다려주지 않는
엄마랑 아버지는 하마, 어제를 먹고 빗물 되어버린
하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나
가득 차면 버려지고
빈자리를 채우는 그들의 은밀한 식사
채우고 출렁거려도 여전히
목이 마른 나도 하마
파문의 반지름
둘레를 흔드는 말이 있다
고요한 수면에 떨어진 첫 빗방울
둥근 물살이 놀란 호수를 가장자리로 몰고 간다
훌라후프처럼 허리를 휘감고
조여드는 말,
수직이 수평에 꽂히는 순간
피어나는 파문은 소리의 바깥을 향해 내달리고
말의 둘레가 출렁인다
지름의 길이와 소란한 둘레는 비례한다
실체 없는 폭로들
던진 돌이 날아와 퍼지는 파장, 그 안쪽은
고요하다
둘레에 도착한 직선의 반지름
깊이가 탈락되고 남은 넓이는 상처의 몫이다
그 많던 동그라미는 어디로 갔을까
둥근 하루가 반으로 접히고 파문이 가라앉은 후
나의 수면은 중심이 휘청거린다
막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씁쓸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