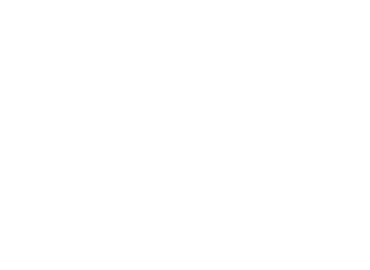배홍배시인의 詩 빗방울 전주곡 외 4편
배홍배 시인 약력
1953년 전남 장흥 출생
2000년 월간 현대시로 등단
시집「단단한 새」「바람의 색깔」(2015년 세종도서문학나눔)
산문집 「추억으로 가는 간이역」「풍경과 간이역」 「송가인에서 베토벤까지」「Classic 명곡 205」
오디오 평론가, 사진가, 번역프리렌서, 한국시인협회 회원
빗방울 전주곡
커피 잔 위로 쏟아지는 쌉쌀한 빗소리,
소리를 향해 빗방울들 날아간다
날아가는 품새로 되던져지는
오각형의 음의 덩어리, 보인다
고요함과
차가움과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노스텔지어 보인다
거꾸로 흐르는 오늘의 가장자리
자정으로 가득 찬 시간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
부패한 전화기가
나의 귓속에 검은 상처를 냈을 것이다
사람으로 넘쳐나는 몸뚱이 끝에서
상처보다 깊게 자라는 고양이 정신과
물물 교환된 나의 전생,
그곳에다 버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에서
날카로운 빗방울은 뿌려진다, 다시 그리운 듯
봄날 일기2
좀처럼 꽃은 피지 않았다
까맣게 탄 날들이 쏟아진 달력에 어머니는
삭망월을 그려 넣고 일요일마다
붉은 하혈을 했다 그리곤 피의 색깔로
앞날을 점쳤다
내일을 믿는 그녀에게 운명은
사람 인人자의 정점에서 피운 꽃 한 송이,
함부로 바람은 어린 앵두나무를 범하고
반성도 없이 가지 끝엔 무채색의 해가 열렸다
표류하는 무역풍에서 며칠이 더 뿌려지고
마른 연못에 고이는 누런 구름,
구름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들의 눈에서
벽안碧眼의 눈동자가 여물었다
다시 태양은 작열할 것인지
햇빛을 대지에 구겨 넣어 어느 때
황무지에 꽃 한 송이 피워 낼 것인지
어머니의 세계는 여전히 달밤이었다
분노인 듯 오래 된 앵두나무는
뒤틀린 달빛 가지를 벋고
꽃의 거대한 뿌리인 산은
우리 집 커다란 장독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아버지의 마당
아버지의 의식이 빠져나간 우리 집
마당에서 어머니의 지평선과
젊은 태양이 마주쳤다
아버지가 만든 연못에선
의심으로 가득 찬 안개가 피어오르고
꽃밭의 해바라기는 태양을 머리로 받았다
깨어진 햇빛은 금 간 담 벽
벽돌들의 보호를 받으며
내 손가락을 깊이 베었다
불신의 조상들에 갇혀
상처를 꿰매는 밤은
바람이 불어도 연못은 고요했다
어머니의 검은 보자기 작은 꽃무늬는
내 평생의 흉터로 남아
가난한 밥상을 덮고
어머니의 은어를 기억해내며
향수를 하나씩 잊어갈 때
사진 속 아버지의 집시 배낭에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어머니와 태양은 더 이상 맞서지 않았다
불면
오늘을 후회하듯 눈은 펑펑 내렸다
하루의 밖으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리드미컬하게 긋는 아픔,
그 아픔으로 적설량이 표기되는
꿈이 버린 수면지대,
눈으로 수몰되는 몸뚱이 안으로
심장은 쿵 가라앉고
외톨이가 된 맥박 하나가 히죽 히죽 떠올랐다
어디로 뛸지 모르는 시간에 밑줄을 긋고
자정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 끝에서 진화한 검은 한나절은
손바닥이 숨을 쉬었을까
숨 한 번 참으면
한 쪽 다리가 자라 머리가 되고
되돌려지는 만큼 메아리를 잃어버린
교회의 종소리가 음악의 기하학적인 문간에서
상냥하게 좌절할 때
바람은 여인숙의 차가운 숙박부 안에서 안녕했다
금욕하는 바람과 바람 사이에서 눈은 더 내려
발정인 듯 벽에 걸린 여우 가죽이 윙윙 울었다
울음끼리 하나로 모이는 사람의 꼴,
모양대로 쉰 부엉이의 목청에서 눈보라가 뿌려지고
울음 속이 비어 외로운 밤새가
유혹하는 대로 흘러, 어제와
오늘이 속죄의 바다에서 만나 조용히 서로를 두려워했다
라르게토를 위하여
이젠 끝내야 해 마주하는 방향으로
숨 쉬는 낯선 공간을
내일 보다 월등한 오늘 밤
춤을 더 추워야겠지, 라르게토
사랑의 무지개가 저무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칠 수만 있다면
너를 잊는 밤은 아름다워
붉고 외로운 체벌인 태양을
증오하는 날들을 위하여
그녀가 외진 곳에서 눈부시게 운다
멀리 뇌성이 데려가는
마지막 오늘을
조용히 붙들 수는 없는 것일까
부엉이보다 낮은 신음으로
그만큼만 뒤로
밀리는 적의의 숲까진 다시 사람의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