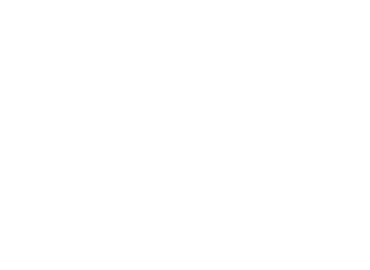임경남시인 약력
2005년 문학예술 등단
2021년 인천예술기금 수혜
2021년 시집 <기압골의 서쪽은 맑거나 맛있거나> 출간
2021년 자기계발서 <나 데리고 잘사는 법>출간
현, 대경일보칼럼니스트
불면
나는 오늘밤도 상트페데르부르크로 간다
그곳에서
태양에 굶주린 부족들과 에르미타주 동굴 잔디 정원에 드러눕는다
온 세상 모든 밤에다 불을 켜고
먼 길을 데리고 온 생生의 연민을 바짝 말린다
이곳은 백야의 도시
불면이 합법화 되어 누구도 잠들 수 없는,
몇 며칠 뜬 눈으로 보낸 도스트예프스키와
술병을 마저 비우는 동안
툰드라의 얼음장은 조금 더 두꺼워졌다
우리를 떠나간 양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아
지팡이로 얼음장을 콕콕 찧으며 양의 이름을 부르는데
북두칠성이
국자모양의 긴 팔을 늘어뜨려
자꾸만 내 잠의 양수를 퍼올린다
서랍
서랍을 열면 오동꽃 냄새
연보랏빛 그늘이 나를 당기네
오월
엄마는 비련의 주인공
영문도 모른 체 오동나무 근처에서 자생하던 나는
속전속결로 슬픔을 레슨 받네
거문고 소리가 나는 내 몸에서
찰랑찰랑 유년이 지나가네
종다리 좁은 부리로 허공을 쪼아도
자꾸만 남아도는 봄날의 오후
덜거덕거리던 유년의 시간을 열고
나는 마트료시카 인형 놀이를 하네
외할머니를열면엄마가나오고엄마를열면내가나오는데나는더이상열리지가않아
감쪽같이 닫아도 자꾸만 비집고 나오는
연보랏빛 엄마
새벽을 열고 저녁을 닫을 때까지
책을 열어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까지
꽃잎을 열어 꽃 피는 환호가 닫힐 때까지
열고닫히는서랍의생각이종다리가되고마트료시카가되고연보라가되는거지
나는 오늘아침
문득 서랍을 열다가
오동꽃의 기억으로 오래오래 접혀 있었네
니스를 나이스로 읽다
구두의 발자국이 반짝거린다
꽃 피는 일이라면 어디서든 나이스
파도의 자잘한 혀들이
해변의 자갈을 훑고 지나가면
눈물마저 푸르른 지중해의 한낮이 된다
해변의 부리로 모여드는 이방의 사람들
모든 소리는 까치발로 다가와
니스를 나이스~ㄹ 하고 지나간다
나는 자지러지는 웃음에 걸터앉아
일몰의 니스 해변을 읽는다
나이스~ㄹ
진달래 실종 사건
엄마, 내 휴대폰과 신발과 영혼을 부탁해 별의 실종은 꼬리라는 단서가 실수야
맨발로 나갈 거야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중얼거리는 말은 입 밖으로 흐르지 않아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 끈질기게 달라붙는 눈빛이 싫어 탈탈 털린 나는 완전 허공이야
실종된 계절을 놓친 꽃샘추위는 견디는 거라고 초과한 불안을 안고 사는 길고양이들이 몰려와 찢어진 쓰레기봉투에 어둠의 전단지를 붙이고 사라졌어
계곡 물소리를 받아먹고 자란 내 귀에 열린 분홍 잎사귀 좀 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잖아
진달래를 따먹고 새가 남기고 간 붉은 열매를 따먹고 아래로부터 텅 빈 내가 차올랐잖아
엄마, 내가 가벼워졌어 처음부터 날개달린 나를 낳아줬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오래 양팔로 무릎을 껴안고 있었거든 눈빛이 숲에 가려 나는 피어날 수가 없었어
제발 나를 신고하지 마 내발자취를 부검하려 들지 마 쪼그려 앉은 날들에 쥐가 나
어디선가 집중 수색하던 봄바람에 들켜 내가 발각되고 말았어 꼬리 없는 별이
어둠의 천장에 박혀 나를 보살피기도 했는데 엄마는 며칠 동안 두견새처럼 울어
목구멍에 피가 났다고 하지 나를 낳은 엄마가 너무 가여워 나는 돌아가지 않을래
고서古書
빈방에 책 한권이 툭 떨어졌다
두꺼운 책은 함부로 열 수가 없다
낡은 방에 고백이 얹힐 때
수암동 산 235번지가 통째로 밀려 나온다
볕 좋은 창가에 한 편의 당신이 돌아오는 중이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버지를 목격한 듯
수백 개의 기척을 소리로 물어온다
무너지지 않는 자세가 멈춘 시계를 가리키고 있다
고서古書에는
사내를 낳지 못한 엄마가 나오고
서서 오줌 누면 뿔이 생갈 줄 알았던 어린 내가 나오고
일찍 객지로 나간 큰언니의 뾰족구두가 나온다
나를 빠져나간 날들이 시간을 헐어 읽히고 있는데
지금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한 시간
꼼짝없이 등 돌리고 누운 저 몸
찢어진 숨소리 데리고 어느 페이지를 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