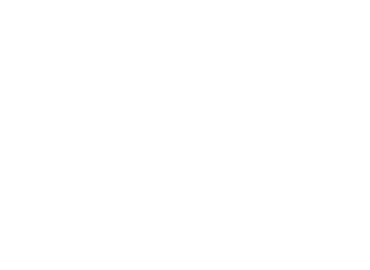이병국시인의 詩 가위 외 4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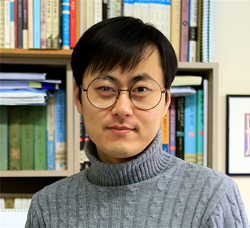
이병국 시인의 약력
2013년 <동아일보>로 시, 2017년 중앙신인문학상 평론 등단.
시집 『이곳의 안녕』, 『내일은 어디쯤인가요』가 있음. 내일의 한국작가상 수상.
가위 - 종이비행기
*
날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건 나아가고 싶다는 말과 같았다
뒤미처 닿지 못했다
*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소독차가 달린다
희부연하게
흩어지는 얼굴로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한다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번갈아 내던 한 아이가 엎드리면
까맣게 지워져 달콤한 낮잠 위로
형편없는 환호가 포개지고
아이는 빗금에 젖어
아무것도 아닌 웃음을 짓는다
*
나는 창 안쪽에서 소매를 동여매고
눈을 감는다
어수선한 바깥이
잘못이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곤경과 우두커니의 다정처럼
풍경은
언제나 안전한 자리에만 머문다
*
날아가지 않는다
손바닥 위에 놓인 마음을 움켜쥐느라 손을 흔들지 못했다
행복하냐는 물음에
괜찮다고 답했다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다
수박맛바를 먹으며 수박의 계절이 돌아왔다고 중얼거렸다 수박 맛이 나지 않는 수박맛바는 수박껍질째 먹어야 제 맛이었고
제멋대로 그은 날들
받쳐 든 손은 괄호였고
떼어낸 질문이 뱃속에 가득했다
언제쯤이면 네가 태어날까
애인의 손을 붙잡고
청과시장에 갔다
둥근 머리들이 솟아올라 우리는 안대를 하고 방망이를 들었다 내리치는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로 일정하지 않지만 엇비슷한 시간으로 나누면
하루에 한 통씩 부수어야 했다
표리가 부동한지 이율이 배반인지 같지 않아 이율을 구할 수 없었다 수박을 긁어내고 수박맛바를 꽂아 만든 화채를 먹었다 우리는 난분분하여 씨를 골라낼 필요가 없어 아무도 태어나지 않았다
괄호에 갇힌 날들이 이어지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졌다
수박의 계절이었다
집에는 집이 없다
늦된 잠에서 깨어 문 앞에 선다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지만
문을 열면
바깥이 있고
나는 아무 데도 없다
나무 그늘에 숨어
꿈쩍도 하지 않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
안은 자꾸만 비어
시간을 앙상하게 한다
그것은 오래된 소풍을 기다리는 마음이라서
나는 모른다
덩그러니 남은 침묵이 벽에 매달려
서서히 낡는다
떠난 이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웃자란 집에 손차양을 친다
빛이 고이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하루가
그림자를 드리운다
나는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리스본
완강하게 버틴 자리가 있다
반듯한 골목을 따라
짭짤한 바닷내음 밀려들고
해독하지도 못할
말들의 내력을 기웃대다
낱낱이 떨어지는 햇빛에
마음을 부딪는다
이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시간
밖을 궁금해 하면서도
문을 열어 본 적 있었나
그러니까
너와 내가
함께인 적이 있었나
뚝 떨어진 상처로
먼 곳의
우리가 있다
에스퍼맨과 데일리
1
옆구르기를 하곤 양팔을 벌려 하늘을 떠받들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디선가 나를 보는 이가 있나,
싶어 두리번거렸다.
연속된 실패가
오므린 입술 사이로 휘파람을 불었다.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눈앞에 맴돌았다.
특촬물은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다.
엊그제 문방구에서 주운 책받침을 신발주머니에서 꺼냈다.
우그러진 책받침엔
희끗희끗한 얼굴이 있고
레이저빔의 빛나는 환희와
스판덱스로 가린 멍과
물집이 돋은 손과
감전된 우주괴물과
우스꽝스러운 리액션과
성실한 폭력으로 파괴된 지붕 밑에
다정한 가족이 있고
잿더미에서 매쾌한 웃음소리가 들린다.
매일이 발치에 쌓이고
이내 버려질 것들을 훑으며
허물어진 집은
능청스럽게 시간을 건너온다.
2
구멍 난 창호에
한쪽 눈을 가져다 댔다.
안마당에 앉아
내던져진 밥그릇과
상다리를 줍는 이를 본다.
지하수를 받아놓은 대야에 하얀 달빛이 넘치고
빛을 내는가 싶다가도
빚을 내는 데 익숙했다.
부려놓은 것들을
말끔히 치우고
치운 자리에
자신을 가라앉게 두는
그녀가
매일 하는 일이란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대문을 열고
쏟아지는 밤 속으로
들어갔다.
호우에 잠긴 그녀를
바라보던
내가
하마터면
휩쓸려갈 뻔했다.
3
일기를 꺼내
어려운 통증을 매만지는 일은
이십 년쯤 뒤의 일이라서
숨바꼭질하듯 매일을 적어 놓았다.
영구도,
영구적인 것도
없다.
솎아낸 말들이 안마당에 흐드러지게 피고
눈을 깜박이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방에 갇혀
성급하게 자랐다.
창호에 구멍을 좀 더 크게 냈다.
틈은 안으로만 새어들었다.
안에서는 바깥이 잘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