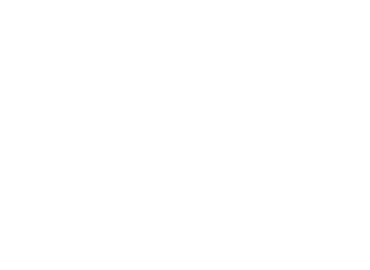신새벽시인의 詩 파랑 아카이브 외 4편
신새벽시인 약력
2017년 월간문학 등단.
제8회 시예술아카데미상 수상.
시집『파랑 아카이브』
파랑 아카이브
클랭*의 파랑을 표절한 바다, 울트라마린
이제 막 노을이 엎어진 갯벌에
모노크롬 터치들이 시작되고 있다
머뭇거림 없이 잡아채야 하는 속도전
파랑만 건져 올려 고요와 함께 봉합해
어둠의 서랍 속으로 밀어놓는다
붉은 얼굴이 반쯤 남았던 해는 빠르게 문을 닫아걸었다
해안선 철조망은 낯선 발자국을 경계하고
하얀 어깨를 처박은 폐선이 낡은 시간을 부비고 있다
해당화는 서걱서걱 모래를 씹고
난 아직도 파랑이 아쉬워 허기를 느낀다
누군가 흘리고 간 우울을
혹여 새의 깃털에 남아 있을지도 모를
불현듯 맨발로 걸어야 한다는 몸의 신호
상형문자 그려진 갯벌을 탐색하듯 걷는다
시나브로 어둠을 깨며
파랑을 채집하고 인화한다
스크랩하며 겹겹이 쌓아놓는 일 에뛰뜨 블루
파랑의 혈통을 가질 수 있다면 내 혈관으로 채워지겠지
*이브클랭: 프랑스 화가(IKB 자신이 만든 파랑)
파도는 연습이 없이 밀려온다
우리의 연애는 솟구치는 분수 같았지
아무런 고백도 들은 적 없지만
깊고 아주 깊은 곳 슬픈 파랑을 끌어와
커다랗게 몸을 뒤집으며 소리 지르지
사랑의 뒤편도 멀쩡하기를 바라는 바보는 아마도 나뿐인 듯해
점점 불시착하는 너의 감정을 난 절반으로 나누고
위험하지 않은 번역으로
난파되어 밀려드는 조각들을 끌어안고 맞추고…
먼 곳 수평선은 멀쩡히 그곳에서 우두커니 지켜보고만 있어
우리의 가장자리는 늘 안부를 모른 체
서두르고 출렁이지
고요를 훔치지 않은 건 연습이 부족해서 인지도 몰라
바람의 행적은 누구라야 볼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하는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너에게서 멀어지는 연습이 될까
그저 바라보고 서서 침묵으로 견뎌야 하는
같은 모습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널
난
얼룩으로 물들어 가는 젖은 모래
쿼터*
빗장뼈 아래엔
아픔에도 지위가 있다고
낯선 상처는
통증의 갈피를 하나하나 세어 가지런히 놓아두지
골절된 수평에 한 가닥씩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
깊은 잠을 잘 때까지 세고 또 세어 낯을 익혀두지
불쾌함이 먼저 손을 들어 질문해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달라고
하지만 그깟 것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쓸모가 있는 아픔이어야만 한다고
침울함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천 길 나락으로
서너 번쯤 떨어져 보기도 해야 해
심장 한 귀퉁이 애벌레가 갉아먹는 몽롱한 현기증
아편 같은 통증은 귀족적이야
봉인된 비밀을 조금씩 떼어 나누지
난 아픔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엉킨 가시 늪에 발을 들이밀지
그러니 날 끌어내지마
고통에 익숙해지면 신분이 상승되지
철저히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거야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쿼터: 4등분하다
허공의 빈방에 허공
잠이 떠돌고 있어
검은 창문 밖을 기웃거리다 식은 커피를 쏟았지
붉은 체리 씨앗이 뒹구는 푸른 카펫 위에 엎어져 너의 발바닥을 바라보고
내 손바닥을 바라봐
바람이 종소리를 내면서 달려오지만 내 머리칼은 날리지 않아
문이 없는 밖에는 잠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수군거리지
매일 금을 긋지만 그어지지 않는 선들이 선로처럼 생겨 난 그 위를 외발로 걸어다니지
달이 잠에게 시비를 걸지
빛 부스러기를 은하수처럼 떨어뜨려 눈이 따가워
달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치고 싶어져
한때 욕조에서 잔 적이 있어
엄마의 자궁처럼, 포근한 요람처럼…
웅크린 다리 사이로 불안감이 빠져나가지
숨 고르기에 숫자를 세지 않아도 돼
시간을 구부리며 불행을 기다려 본 적도 있지
허공에서 허공으로 넘나드는 꿈을 꾸었던 비행飛行의 날들
술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난 커튼 뒤로 숨어버리지 눈을 맞추는 걸 금지 할 거야
여보세요
잠을 배달해주세요 여기 주소가 허공 저택입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안부
지구의 숨소리마저
빈 접시처럼 고요해지는 오후
알전구 무료하게 흔들리는 나른한 카페
커피 잔을 잡은 손을 물끄러미
헐렁해진 살갗에 내려앉은 검은 점들
이젠 얕은 물웅덩이에 걸려 넘어지는 허술한 몸뚱이가 되었다
안아 주기도, 매만져 주기도 안쓰러운
검은 봉투에 담겨 있는 붉은 원피스는 누굴 위해 샀는지
슬픔이 함께 구겨져 있다
내가 알고 있던 것은 흐려지고
내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고양이 눈으로 밝힌 등대 빛처럼
지척에서도 가늠 할 수 없다
어디에나 기대고 싶고
아무 곳이나 밀착하고 싶은 오후
왼손을 오른손이 가만히 쓰다듬는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