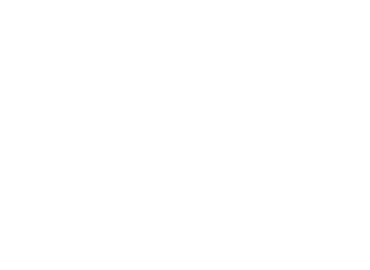김남권시인의 詩 입장정리 외 4편

김남권시인약력
월간 시문학 등단
아동문학가 시낭송가
한국시문학문인회 회장
계간 P.S(시와징후) 편집장
시집 적막한 저녁 외10권
동시집 선생님 복수타임 외3권
시낭송 이론서 마음치유 시낭송 외2권
입장정리
아무리 착한 동물도 입은 날카롭지
아무리 순한 짐승도 입을 벌리고 밥을 먹을 때
건드리면 물리고 말지
아직 이가 나지 않은 아기는 울음을 터뜨려
이빨 자국을 내지
오두막 집에 들어갈 때도
궁전으로 들어갈 때도
입을 열어야 하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탈 때도 입을 열어야 하지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입을 찾지 못해 나는 여전히 길 위에서 방황을 하고
우주로 돌아가는 입을 찾지 못해
수십 년째 지구를 방황하고 있지
그렇지만 참으로 다행인 것은
내가 좋아하는
나비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는 거야
그 아름다운 무늬로 햇살을 탁본하고
키 작은 대롱으로 수액을 빨아먹는다는 거야
나도 이제 이빨을 그만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버지의 봉투
어린 시절 아버지의 귀갓길이 기다려지는 건
오직 누런 봉투 때문이었다
어떤 날은 따끈따끈한 호떡이 들어 있었고
어떤 날은 김이 폴폴 나는 군고구마가
들려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엔 튀긴 통닭이 들어 있었다
그 때는 솔직히 아버지 보다
누런 봉투가 더 기다려졌다
취기에 얼굴이 붉어진 아버지가 잠바 주머니에서
수줍게 꺼내 놓던 월급봉투도 누런색이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내가 아버지 나이를 넘긴지
한참 지난 지금도
길거리에서 누런 봉투를 들고 가는
남자들을 만나면 그 속의 내용물이 궁금해진다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봉투마저 사라진지 오래고
시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음식이 까만 비닐봉지에 담기면서
우리는 각자의 동굴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시절 아버지가 들고 들어왔던 누런 봉투는
가난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유일한 온기였다
봉투 하나를 전해 드릴 아버지마저 사라진 지금
나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버지의 누런 봉투 속에서 꺼내 먹던
호떡 군고구마 튀긴 통닭만큼
배가 부르지 않다
허겁劫, 지겁劫
주천 파주 식당 앞 버스정류장에 어르신 몇 분 나란히
가을 햇살을 받고 앉아 있다
제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지 황둔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지
모르는 할머니들이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호구조사를 하는 동안, 형제 수퍼에서 나온 아저씨 한 분,
빵과 우유를 할머니 한 분에게 건넨다
“에구구, 이걸 어쩌나 내가 괜히 배고프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비싼 빵을 사오게 했네”
두 시 반이 지나도록 점심 값이 아까운 할머니의
혼자 말을 들은 아저씨가 슬그머니 수퍼에 들러
빵과 우유를 사가지고 나와 무심하게 전해 드린다
할머니는 허겁지겁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허리를 편다
저렇게 수십 년을 배 곯아가며 자식들 입에 들어갈
음식을 생각했을 것이다
택시비도 아까워 한두 시간씩 정류장에 앉아
햇살을 세고 있었을 것이다
젊은 시절 겁 없이 걸어 다녔을 수십 리길을
이젠 버스로 십 여분이면 도착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몇 곱절은 더 길어진
아무리 생각해도 본전 생각이 나는 그런 겨울 버스정류장에서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 아들 같은 남자가 건네주는
빵과 우유를 먹는다
속은 허해지고
겁은 많아지고
시간은 없는데
겁劫은 헤아릴 수 없이 길고,
부르지 못한 별의 노래
어머니는 화전민의 아내였다
열여섯에 시집 와 열일곱에 나를 낳고 보리죽으로
연명했다 화전엔 감자와 메밀밖에 심을 수 없어서
낱알로 된 곡식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어린 어머니는 젊은 시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들로 나물을 뜯으러 다녔고
아버지는 농사일보다 투전판으로 어울려 다녔다
이 년 뒤 남동생이 태어났지만 살림살이는
좀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싸립문 밖은 늘 굶주린 부엉이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이듬해 함께 월남해 화전을 일구던 큰아버지가
원인 모를 병으로 숨을 거두고
어머니는 두 살 된 남동생만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렇게 사춘기가 지나도록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별을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외로움도 늙어가기 시작했다
열일곱에서 시작한 객지 생활 내내 어머니는
방구들 속 고무래처럼 따라왔고
아버지는 먹구름처럼 몰려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나는 초저녁 하늘만 쳐다보면
차마 그 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라목손
토요일 아침 일곱시,
영등포구청 환승역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청년을 보았다
검정색 코트에 정장을 하고
슬픔을 가누지 못하던 ᆢ
내 아버지의 발걸음처럼 좌우로 흔들거리며
5호선에서 2호선을 향해 가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평생을 걸어 왔을것이다
아무도 붙잡아 주지 않았고
아무도 큰 소리 치지 않았다
새벽을 지나도록 술을 마셔도
허구한 날.
모르는 여자의 치마폭에서 잠이 들어도
매일 매일 헤어질 결심을 한 탕웨이처럼
바닥이 보이지 않는 물속을 헤엄치며 여기까지 왔다
나는 오늘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간다
한 번도 날아본 적 없는 내가 드디어
구름 위를 날아 하늘 한가운데로 들어간다
아침 일곱 시의 그 청년은 2호선 터널을 빠져 나가
한강 철교를 지나고 있을 것이다
비척 비척,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그라목손*을
막걸리에 타서 단숨에 들이켜던 이십 수 년 전,
내 아버지처럼
*치명적인 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