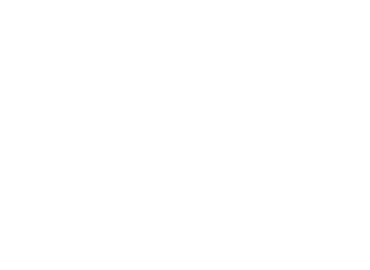김밝은 시인의 詩 이팝나무 아래서 외 4편

김밝은시인 약력
2013년 『미네르바』로 등단.
시집 『술의 미학』『자작나무숲에는 우리가 모르는 문이 있다』
시예술아카데미상, 심호문학상 수상
현재 한국문인협회 편집국장,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
이팝나무 아래서
저만치서 머뭇거리는 봄을 불러보려고
꼭 다물었던 입술을 뗐던 것인데
그만,
울컥 쏟아낸 이름
고소한 밥 냄새로 찾아오는 걸까
시간의 조각들이 꽃처럼 팡팡 터지면
기억을 뚫고 파고드는 할머니 목소리
악아, 내 새끼
밥은 묵고 댕기냐
애월涯月을 그리다 3
애월,
감긴 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 믿으며 나누었던
따뜻한 말들이 등뼈 어디쯤 박혀 있다가
울컥울컥 상처꽃으로 피어나는 시간인가 봐
순비기꽃빛으로 저녁을 짓던
저녁은 알아챌 수 없는 표정으로 울음의 기호들을 풀어놓았어
소금 기 밴 얼굴의 벽시계가 안간힘으로 낡은 초침을 돌리고
사람들 목소리 하나 앉아있지 않은 횟집,
수족관에는 생의 하루를 더 건넌 물고기의 까무룩 숨소리가
달의 눈빛을 불러들이고 있어
눈물로 온 생을 지새울 것만 같던 순간도 잊혀지고
단 한 번뿐일 것 같았던 마음도 희미해져 가는 거라고
어둠을 밀어내며, 달은 심장 가까이에서
바다의 기호들을 꺼내 가만가만
물고기의 붉은 아가미 사이로 들여보내주는지…
애월,
죽어서야 정갈해지는 아픈 생이 어디에나 있어
매화서옥도(梅花書屋圖)*-대흥사 초의매
터져 나오는 신음을 꼬집으며
손등에 떨어지는 눈물로
몰래 훔쳐둔 소식을 그리는 중입니다
세상의 벽은 너무 가팔라서
퉁퉁 부은 손으로 오르기엔 뼈저린 곳인데
꿈꾸는 한 발, 내딛는 건
차마 욕심일 뿐이라고
적묵당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
경전의 향기를 붙잡고 있어요
막막한 예언에 갇혀서도 간절해지는,
만개한 당신 얼굴
어느 시절의 안색으로 그토록 눈부신가요
*조선 후기 화가 조희룡이 그린 산수화.
가파도라는 섬
아무도 모르게 껴안은 마음일랑
가파도 되고 마라도 되지,
어쩌면 무작정 가고파 일거라는 말
고개를 저어도 자꾸 선명해지는 너를 떠올리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함께 달려와
까무룩해지는 장다리꽃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곤 하지
바람을 견디지 못한 이름들은 주저앉아버렸고
청보리는 저 혼자 또 한 계절을 출렁이고 있는데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라는 말이
명치끝에서 덜컥 넘어지기도 하는지
곱씹을수록 까슬까슬해지는 얼굴도 있어
보고파, 라는 말을 허공에 띄우면 대답이라도 하듯
등 뒤에서 바짝 따라오는 파도의 손짓까지
뜨겁게 업은 너
심장에 가까운 말* 한마디는 어디에 숨겨놓은 것일까
*박소란 시인의 시집 제목 인용
능소화
미풍만 불어도 간지럽다
기다림의 자리마다
살구나무 그늘아래 살고 있던
그리움이 건너오고
그대 눈빛에 주저앉은 내 심장
몸살을 하고 있다
염천의 허공을 배회하던 숨소리도
저마다 별이 되어 하늘로 돌아갈 때
꽃잠을 꿈꾸던 죄로
딩
딩
딩…
온몸 울리며
내가 눈멀어 가는 길
세상이 툭,
숭어리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