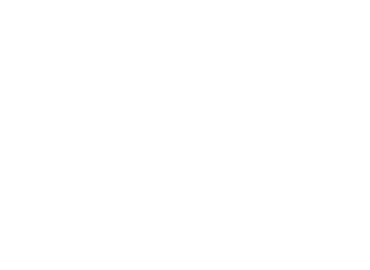김선옥시인의 詩 바람 외 4편

김선옥시인 약력
1955년 문경출생
2019년 애지문학신인상, 백화문학상,
문경 문협 부회장,글 사랑문학회 동인
시집『바람 인형』
바람
그는 왜!
풀밭을 열어보려 했을까
옹이로 불거진 손길 없이도
무성하게 자란 텃밭에 풀들이 몸을 낮춰
살아내는 법을 알아간다
살구나무 그늘이 놀라 자지러지고
맑은 하늘도 몰리는 구름에
조각난 그늘이 된다
세상은 늘, 양철지붕에 바람 깨지는 소리가 난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대문을 두드린다
안쪽에선 누군가
맨발로 풀밭을 질질 끌고 나와
녹슨 대문을 열려고 삐걱거린다
쿨럭거리던 할아버지 기침 소리와
내 어린 추억과
내통하는 자는 어떤 관계인지
바람이 수시로 제집처럼 드나든다
먼 산처럼 다가와 뿌옇게 시야를 풀어놓은 황사에
숨이 멎는 순간에도
거미는 바람에 기대어 집을 짓는다
돌 깎는 남자
석재 공장을 지날 때마다
톡톡톡! 새 알 깨는 소리가 난다
몸통을 벗고
탁탁탁! 툭툭툭! 날개를 키우고 있었나 보다
검독수리 한 마리 큰 날개를 펴고
비상 준비를 한다
저 새는, 시베리아 쪽으로 가려는 것인지
캄캄해서 차가웠던 돌 속의 세상
제 몸을 박차고 날아갈 기세다
깃털 하나하나를 달아주며
아비 같은 마음으로 다듬고 또 다듬었을
석수의 손에서 태어나고 무럭무럭 자랐던
석공은 나처럼
깎고 갈고 어루만지며 땀 흘리고 키워
멀리 떠나보내는 날은
시원하고 섭섭하고 기뻤을 것이다
아니
보낼 곳이 없어
돌을 쪼는 동안
그리 오래도록
한마디 말없이 침묵했는지도 모른다
돌을 깨던 첫 망치질에서
마지막 완성의 시간이
검독수리의 일생이었음에
침묵하는지도 모른다
꽃밥
내장 속에 꽃이 핀다
천안, 허브 식당에서
꽃 비빔밥을 먹고 온 날부터
가지각색의 꽃들이 핀다
쭉쭉, 줄기는 내장 끝까지 뻗는다
내장 속에서도 향기를 머금은 꽃이 피다니
해마다 잘 익은 봄날을 한 아름씩 건네며
말도 없이 잘리는 가위질이 다녀간다
갓, 땅과 결별한 꽃잎의 수런거림을
코끝은 쥐었다 풀어놓는다
죽음이 이렇게 싱싱하고 향기롭다니,
살아 숨 쉬는 내장 길을 활짝 열었다
겹겹 물길을 틔워
심장 소리 둥둥거리는 한 척의 배에 실려 오는
꽃잎의 한 시절들
왕성한 식욕이 다녀가고
향기는 입속에 뿌리 없는 제 몸을 묻는다
바람 인형
바람이 잔뜩 든 여자
바람이 눈이고 소리고 콧대인
몸 안, 밖의 일이 온통 바람인 저 여자
가슴 가득 바람을 불어넣어
몸을 일으키는
세상의 바람만이 뼈임을 온몸으로 느끼는 여자
환한 목련꽃이 가지 가득 물을 뿜어 꽃잎이 절정이듯
도심 가득 사람들을 풀어 표정들이 혼연히 피어나는 거리
한사람이 홀로 절정이 되게 할 줄 아는 거리
한 발짝도 몸 옮길 줄 모르는 저 여자도 살아가는 거리
낮일을 못 하는 여자는 밤일도 못 한다는
상사에게 대들다 해고 통지받고 돌아서는 저녁
공장 돌아 도심 어디에도 몸 들일 곳 없는 거리
알량한 관절을 꺾어야만,
길가는 사람들을 유혹해야만 하는 인형의 바람이
더욱 팽팽해지는 저녁
붉은 노을빛에
몸 두고 얼굴만 벌겋게 달아올랐다
몸뚱이가 온전히 서기까지 절정에 이르기까지
쓰러질 듯 주저앉을 듯
구겨진 마음의 관절을 접었다 펴는 데는
저만큼은 능숙해야지
말랑한 구름이 잘 익은 달을 낳지
생각하다가도 깨끗한 불빛이 서러운 여자
묵란도
갈대꽃을 거꾸로 잡았다
붓이 되어
난잎이 아니어도 휘어진 그림을 그린다
블라우스 앞자락을 들추는 바람을 그리고
나뭇가지 휘어지는 새소리를 그리고
골목을 휘는 아이들 웃음소리를 그리고
두루미가 밟고 있는
굽이도는 강물을 그린다
붓 하나 잡고 먹구름을 찍었을 뿐인데
붓끝에서 세상이 다 휘어지는 그림이 된다
굽어지는 법을 모르던 남편 등이 휘고
풀들이 누우며 바람을 휘고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얹힌
고음과 저음의 새소리가 휘어지며
그림이 된다
붓을 놓고 바라본 앞산에서
부엉이 소리가 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