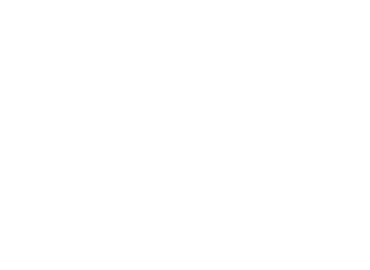고광식시인의 약력
시인, 문학평론가. 1990 년 『민족과문학』 신인상을 통해 시인으로, 2014 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 1991 년 『청구문화제』 시 부문 대상. 2018 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시 부문 수혜. 2020 년 아르코문학나눔 선정. 『열린시학』 편집위원. 추계예술대 출강. 시집 『외계 행성 사과밭』이 있다.
가을 허수아비
날아들지 못하는 참새의 부리가
들꽃 이슬에 젖고 있다
누더기 뒤엉킨 넋들만
다리 하나로 버티는 가을
허공에 띄워 놓은 눈썹이여
해갈의 바람 부는 날갯짓으로
또 무엇을 쫓기 위해
빈 가슴을 통통거리는가
들판, 너스레 떠는 표정 아래
웅크린 벼들이 머리 숙여
막걸리 잔을 비우고 있다
눈뜨고 날아들지 못하는 새들과
손이 없는 허수아비의
등돌린 대립 ,
밀짚모자를 쓰고 있으면
가을은 참새의 혓바닥으로 기침을 한다
목울대가 손금을 긋는 밤마다
한 마장쯤 물러선 동구 밖에서
나는 떨어진 밀짚모자를 벗는다
들판의 눈썹을 걷는다
녹슨 포경선
포경선이 녹슬지 않는 분노로 묶여 있다
포구 속에 숨어 있던 갈매기가
빛나는 작살 모양의 날개를 펴며 날아오른다
고래잡이가 금지된 항구길 따라 길게 늘어선 주점들
포경선은 고래가 흘린 질긴 울음소리 찾아
뱃머리의 포신을 수평선에 맞춘다
깃발은 고르고 판판한 갑판 위에서
조금씩 붉어지는 얼굴로 갸웃거리며 나부낀다
수면을 가르며 떠오를 고래의 등을 향해
포경선이 거친 숨소리를 간헐적으로 내뿜는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날을 원망하듯
뜨겁게 흘러가는 긴 하루의 해가
북해도로 향한 항구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든다
방파제를 때리며 파열음으로 부서지는
작살 움켜쥔 포수의 목표물들, 바닷속을 기어 나와
어느새, 장생포항 시린 갈비뼈로 구부러진다
파도가 앞다투어 망가지는 방파제 위
고래의 갈비뼈로 교문을 세워놓은 장생포초등학교
어부의 심장이 고래의 배 속에서 뛰기 시작한다
그날 이후, 복원하지 못한
어부의 꿈이 장생포항 방파제 따라 하염없이
고래의 거친 숨소리를 쫓는다
우렁각시
―가사도우미 J의 하루
그녀는 남자가 나간 뒤에 출근한다 텅 빈 집 안은 금세 멸치볶음 냄새로 따뜻해진다 거리의 은행나무는 보낼 수 없는 편지를 바람 불 때마다 부친다 그녀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인다 가난은 파출부의 꿈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지만 단단한 은행알로 여물기 시작한다 는개 같은 눈물이 양념으로 식탁에 놓인다 그녀는 마음을 쓸듯 집 안 구석구석 청소를 한다 허물어질 수 없는 삶을 곧추세운다
그녀는 남자가 오기 전에 퇴근한다 은행잎 몇 장이 바람 위에 앉아 있다가 해 뜨는 쪽으로 날아간다 단칸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뒹구는 은행잎, 딸의 눈으로 푸른 하늘이 흘러들어 간다 햇살을 받으며 은행알이 여물고 있다 그녀와 마주치는 딸의 눈, 애틋한 웃음이 번진다 퇴근한 그 남자 그녀의 밥상을 받아놓고 사랑할 누군가를 그리워하겠지 아마 우렁각시 같은 사랑을 매일매일
연어 귀향
파도를 타던 꽃피는 이웃들과 함께 강으로 간다
그리운 햇살에 몸 반짝이며 솟구쳐
꽃무늬보다 싱그럽게 태어날 새끼들을 위하여
작은 폭포도 해일처럼 뛰어넘고
이삼 년 푸른 파돗발을 먹은 내가 강으로 거슬러 돌아간다
참 드넓은 세상 많이 구경했지
먹이사슬의 냉혹함으로 뒤를 돌아보면 큰 고기들의 횡포와 흉물스런 폭력 앞에
한낮의 행복한 가족 나들이도 불현듯 죽음이 되는
보호색으로 몸 부지하는 물고기들이 보인다
설레는 심장 쿡쿡 누르며 몇몇의 이웃들이
불룩한 배 강물에 담그고 꼬리지느러미를 흔든다
큰 폭포 만나 절망하다가
갈대꽃 흩날리는 모래밭을 바라보며
비늘 조각조각 갈기를 세우고 몸 솟구친다
애틋한 새끼 태어날 곳 어찌 그립지 않으랴
빛나는 속살로 물안개를 뿜으면
그곳의 눈에 익은 색깔과 냄새 ,
붉은무늬주둥이를 밤새워 흔들며
입덧으로 가슴 통통거리던 우리들은 강으로 간다
태반처럼 낮고 아늑한 강으로
꽃잠 자던 몸 풀기 위하여
모래와 자갈밭을 택하여 꼬리로 구덩이를 판다
뿌리의 터 꿈틀거리는 모래 속에
알을 낳고 꿈의 자갈로 덮고 나면
상처가 깊어 시린 강물에 몸을 떤다
나의 새끼들아 다시 가거라
너 태어나 아가미의 갈증보다 깊은 파도소리 들리거든
등뼈 꼿꼿이 세우고
먼 바다 거친 세상 속으로
포장마차 소묘
노을의 입술 더듬으며 등 굽은 나무의자에 앉는다 숨 가쁜 낙지발로 몸을 꼬는 피곤한 허리띠를 풀고 진열장 밖으로 걸어 나온 내 생애의 하루가 그대의 시퍼런 식칼과 마주섰다 물오징어의 등뼈 곧추세우는 이 도시의 어디에 바다는 있을까 꿈틀대는 산낙지의 그리움도 포장마차의 무심한 천조각이 되어 꽃여울로 앉아 있고 귓가를 걸어가는 기다림은 쓸쓸한 소라의 목울음으로 도마 위에서 짧게 잘려나가는데 가슴에 묻은 꿈 하나 위장에서 떼지어 자맥질한다 젊은 어부가 끌고 온 바다가 마차 바퀴에 휘감긴 채 자꾸만 발 빠르게 달아나는 이 저녁 내 생애의 하루가 도마 위에서 낯선 모습으로 숨소리 고르게 칼질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