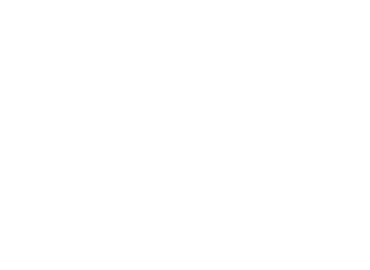이영미 시인 약력
청주시 거주
시인, 수필가
에세이 문예, 수필 신인상 수상.
시 <목어>로 제28회 지용신인문학상 수상.
몽돌의 나이테
부르지 않아도 바람 일고
까닭 없이 파도는 밀려와
등 내밀어 불 밝힌 뒷걸음
둥글게 그리다 뭉개지고
억겁 년 걸어들어간 만큼
얼룩만 지워진 것은 아니었기에
닳아 없어진 맨발의 기억
찾아내는 일이란
나울나울 스며든 물의 옷자락
체로 건져올려 말리는 것이라서
보이지 않으나 내보여진 생애
지문 몇 획 읽혔거나
때때로 밑줄 그어 짙어질
견디다 못해 써 내려간 무언의 내력
몸 부풀린 바람은
어디를 또 장악하려 드는지
빗장 풀린 석문 (石紋 ) 금이 가고
삼켰으나 끝내 배설시키지도
걸어 나오지도 못하는 균열의 터널
그 식은태 속으로 에둘러 들어갈 뿐
물음표
점점이 뿌리려다
곧추세워 놓고, 반응
부딪칠까 확인하고
등 둥글게 말아 뒤로 빼는,
방어를 앞세워 안심하려는 다짐
솟았으나 허물어진
알다가도 모를 사랑니 같은
변變을 위한 변
숲이 주는 초록빛 말씀
짧기만 하다는 꽃의 엄살도
놓치지 않고
날개 있는 것들 빛바랜 아우성과
꼬리 거둔 것들 변태의 이중생활,
수피에 눌어붙은 이끼가
그대로 나무가 된 사연도
시시콜콜 들어본다
지붕을 끌고 가는 개미
무거울까 적당히 옮겨주고
그를 그리는 일까지
여기에
걷다가 떠오르는 문장 넣으려
길바닥에 붙박이장 된 나까지
내 안에 머문 이 모든 것들
한 달도 못 채우고 색을 버리는
정수리처럼 변하기도 해
문득문득
이탈한 나를 정상궤도에 올리려
변죽만 울린다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변덕, 변심이 아니라
단지
더 나은 시작을 찾느라
변환시키는 행위일 뿐
뒤엉킨 반백 머리
거울 앞에 서서
화려한 변색을 꿈꾼다
저녁을 훔치다 (춘분 즈음에)
비 갠 호숫가
짓무른 밤을 이겨낸 낯빛이
게워낸 아침 햇살을 더디 먹느라
아직 창백하다
시간이 지나간 수면의 빛과 색을 뒤로하고
산 그림자 속 은밀하게 자라는
여린 손톱 싹을 손바닥 내 좌표 안에
우선 먼저 두기로 한다
깊게 팬 바닥을 펼쳐 우물둔덕을 없애고
당신을 세로축으로,
내가 걸어온 생을 가로축에 두어
혼탁한 못엔 달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말을 적용시켜
둘 사이 보폭과 보폭을 포개어 재 본다면
내 엄지 하나로는 저녁까지 덮어주지 못하고
낮 시간, 햇살 펼친 당신은 내 어둠을
포옥 감싸줄 테니
소나기 훑고 간 자리, 머문 만큼 한 뼘 더
산 그림자 짙어갈 터
바람과 비 물러나 고요해진 한낮
왼편으로 번지는 호반, 찬란한 봄을 바라보라던 적이 있다
옆을 향한 나로서는
붉게 달아오른 명자꽃 당신 얼굴뿐이었고
그때부터였을까
밀어낼 줄 모르고 당기기만 했던
볼록렌즈 봄, 까맣게 타올라
밤의 적막 내리기 전
저녁을 데려온 것이
목어 木魚
헤엄쳐서라도 뭍 너머 섬과 섬 건널 만큼
눌러도 솟구치는 바람, 비늘로 덮을 만큼
거대해져라 주문을 걸었으나
제 살 태워 얻은 것이 겨우 나무 몸뚱이라
삼켜 채웠던 비릿한 한살이, 게워낸 텅 빈속
뼈대 긁어 귀 열라 들려주는 붉은 속울음
티끌 걷어내려 아가미 시리도록 울어보는 것인데
바당보름 불어 건져올린 심해의 말씀
눈 푸른 운수납자 깨워 풀어가는 님 앞에서
더 갖지 못해 속 끓이던 욕심 들킨 양
미안하오 미안하오, 오래된 기약만 되뇌며
늙었으나 견고한 결 주름 매만지던 봄날
화암사 우화루 마당이 그토록 환했던 이유는
오색 옷 한 벌 걸치지 못했어도 잠 못 들며
꽃비 나긋이 바라보던 님의 그 눈빛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