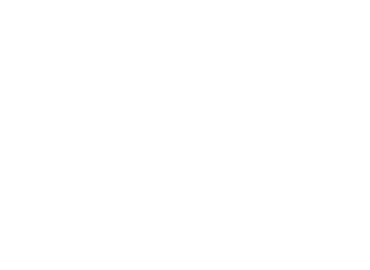경기명 시인의 詩 치목 외 4 편

경기명 시인 약력
충북 중원 출생
계간《다시올문학》신인상
치목
썩은 서까래 하나를 빼내자
봉인 풀린 지붕 사이로 푸른빛이 쏟아져 내린다
오래 묵은 먼지들이 놀란 새떼처럼 솟구쳐 날아간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나무부터 잘 다뤄야 하는 거여 ...
소나무의 껍질을 벗겨내는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막걸리와 송진 냄새가 끈적하게 섞여 있었다 다듬어 올린 서까래 위로 양철지붕이 솟았다 비가 오면 지붕에선 텅 빈 소리가 울렸고 , 낙숫물을 바라보는 그의 등은 낮게 굽어 있었다 어느 겨울 , 아버지는 마을 입구 도랑에서 나무상자 속 동태처럼 얼어 있었다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부으며 그의 삶을 뜯어냈다 양철지붕 위로 하얀 대팻밥이 속절없이 쌓이던 날이었다
썩은 서까래를 토막내 아궁이에 넣는다
찬바람의 무게에 휘어진 허리 ,
쉼 없이 흔들리며 깊어진 빗장뼈의 통증이
불꽃으로 피었다가 회색 재가 되어 뒷산 자락으로 돌아간다
오래전 떠나왔던 그곳에서
어린나무의 잎으로 다시 피어날까
통나무를 다듬어 지붕으로 올린다
오래전에 맡은 냄새가 손바닥에 묻어난다
받들어 주는 아들의 허벅지가 들보처럼 굵다
안개 처방전
안개가 가득 낀 날은 신경정신과로 오세요
자작나무 숲길을 따라
동그란 고라니 눈으로 천천히 걸어요
당신의 뇌세포를 푸른 하늘로 채워 드릴게요
여기 MRI 사진 보이시나요
철 지난 백사장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말소리가 어눌해지기도 하죠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고사목이 되면 바람 소리가 그칠 뿐이죠
습자지 같은 안개가 다시 번지면
커튼을 여세요
하얀 풍경 속으로
지나온 흔적이 가지를 뻗으며 평온한 밤이 찾아오겠죠
사탕 하나 드릴까요
달콤한 걸 드시면 소풍 가는 꿈을 꾸죠
나무가 따뜻한 내복을 갈아입네요
다음에 오실 땐 청바지가 좋겠어요
처방전 가득 파릇한 세포가 돋아난다
병실 밖 갈대숲 사이로 링거 호스 같은 강이 붉게 흐르고
누군가의 내력을 되짚듯이
사이클이 힘차게 거슬러 올라간다
복도는 길고 복잡하지만 ,
햇빛은 방향을 잃지 않는다
활공장에서
오래 머물기 위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팽팽한 윈드삭 *의 유혹
펼쳐 놓은 깃털이 떨리며 부풀어요
날개는 있지만 , 그렇다고 새도 아닌 채로
타인의 발코니 창에 비행 궤적을 그려요
거친 숨을 뱉으며 오르던 계단과 문은 보이지 않아요
정해진 각도로 비치는 햇살은 창백하고
바람의 길도 계산되어 있어서
경계를 벗어난 날갯짓은 팔다리 없는 풍선처럼 버둥거려요
하늘에는 아무것도 머물지 않네요
상승기류에 실린 높이만큼 ,
기압의 차이만큼 떠있을 수 있어요
바람에 맡겼던 시간이 지나면
촛농 같은 날개를 접으며
깃들 곳을 찾아 고도를 낮춰야 하죠
착륙장의 윈드삭을 내려 보며 하강을 위한 방향을 잡아요
아래에는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겠죠
양력 잃은 캐노피 **를 가방에 담아요
별자리에 새기려던 행로를
한 아름의 사각 천으로 접어 넣어요
*Windsock 자루 모양의 바람개비
**패러글라이더의 날개
부레옥잠
오늘은 얼마나 아래로 흘러왔을까
저번같이 비가 내린다
이삿짐을 부려놓고
눅눅한 이불에 기대어 쓰린 위를 달랜다
잔잔한 물보라에도 흔들리는 수생의 바탕은
어두운 블루
젖은 몸이 자꾸 아래로 가라앉는다
얼음의 계절엔 겹겹이 퇴적되어
바닥에 누워있지만 ,
언젠가는 물비린내 진한 부력으로 떠올라
연못 가득 보랏빛 꽃을 채우겠지
뿌리 내리기엔 너무 먼 물의 땅
그 아래엔 다시 하늘이 있고
열어젖힐 창문이 있는지 ,
달은 차오르는지
스크린도어
햇빛은 항상 늦게 도착한다
내가 지하도 깊숙이 내려간 뒤에야
느긋하게 거리를 건너 온다
너무 느려서 내게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
열차가 들어온다
스크린도어에 비친 무표정한 내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지다가
문이 열리면서 이내 사라진다
웃고 있었던 걸까
울고 싶었던 걸까
매일 이 지하도시를 통과한다
소독된 조명이 햇빛을 대신하여
나의 피부를 하얗게 씻어준다
열차 속 사람들의 체취가 닮아간다
눈빛의 조도도 비슷하고 끄덕임도 같은 방향이다
몸을 맞대고 서 있어도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없다
온통 절연재로 만들어진 사물들 사이에서
유리창 밖의 어둠을 바라보다 잠이 들거나
별을 생각한다
열차가 서면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각자 플랫폼을 빠져나간다
한 발짝의 거리에 안전과 불안이 겹쳐있다
계단을 따라 출구로 올라갈수록
날것의 햇빛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