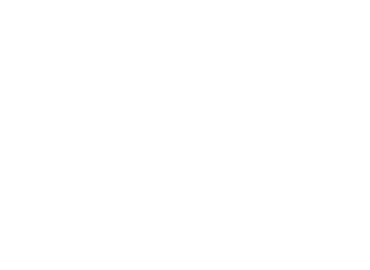김미선 시인의 약력
1960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났다
2005년 「문학저널」등단
시집 『섬으로 가는 길』, 『닻을 내린 그 후』 『바위의 꿈』
산문집 『매일 저녁 타이어를 빼는 남자』가 있다
함박이라는 섬
내 어린 그때
우주만큼
큰 몸집이었지
이제는 갈수록 작아져서
손바닥으로 가려도 되는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섬 아닌 섬
푸르고 넓은 바다는 사라지고
내 가슴속에 가시로 남아
지나간 세월을 찔러대는
잃어버린 첫사랑의 이름
함박도
슬쩍
육지에 살면서 아무리 버무려도 맛 들지 않는
맹물 같은 싱거운 삶! 스며들지 않는 짭짤한 맛의 허기
고향에 가면
눈여겨봐 두었다가
슬쩍 도둑질하듯 챙겨 오는 만지고 놀던 그 흔한 것들
하나 둘 차츰 낡아져 가는 것
애처로워 간절하게 챙기고 싶었던 것들
딸 여섯이나 낳은 옆집 남선네, 딸들은 다 도둑년이라더니 마음 콕 찔린다
처음에는 화단 밑에 버글버글한
심해 속에서 건져 올린 고둥 껍데기
나에게 없는 그 흔한 것
조개껍질 그것만 몇 개 집어오고 싶었다
그 다음 해는 춘란 몇 포기
그 다음에는 팔손이 동백나무까지
그 다음 해는 엄마가 쓰던 손때 묻은 접시 몇 개까지
점점 더 간절해지는 것들…
새벽 바다
아침노을 저녁노을까지 다 챙겨 오고 싶은 마음
해조음에다 갈매기까지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저 통통배까지 다 슬쩍 챙겨 오고 싶은
아예 느른 바다를 쥐고 하루 종일 조몰락거리던 빛나던 윤슬, 물보라까지
다 데리고 와 옆에 두고 살고 싶은
그 투박한 말 매무새와 못다 나눈 인정까지 끝도 없는 이 도둑 심보
미역 꼬투리
바다에서 살다가 건져져
육지로 실려 오게 된 미역 꼬투리
빨랫줄에 매달려 온 집안 냄새를 풍긴다
낯설고 끈끈한
바다 냄새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꼭 그해 나 같다
비린 이야기 찾아
귀와 눈이 쫑긋했던 허기진 일상으로
하루를 마감했던 시절
쉽게 그 냄새를 떨칠 수 없었다
살던 곳 냄새 한 보따리 챙겨 와
꼭꼭 숨겨놓고 몰래 꺼내보는 것
빨랫줄에 걸린
비린 냄새 가득한 마른미역 꼬투리
바라보며 킁킁거린다
소중한 것은 숨바꼭질하듯
어딘가 꼭꼭 숨어서 냄새를 풍긴다
그 섬
섬에 가면 추억이 새록새록 꽃잎 피우고
내 젊은 날의 화사한 꽃송이로 만개하려니
그런 날이 올까! 바로 저 환상의 섬 바위로
지금은 없는 그 섬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그날 그 시간 그 풍경은 어림도 없겠지만 물새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던 해변의 바위
물고기들이 얕은수면 위에서 나를 홀리고 게 고동도 참고둥도 몸을 떨면서 숨 쉬던 곳
해초들은 해풍을 따라서 너울춤을 추던 곳
물발자국이 아기 발바닥 같았던 아! 그 섬
남쪽 하늘아래
하늘빛은
내 서러움의 배경이었고, 구름은 눈물의 경지이고
푸른 바다는 온통 그리움이었다
같이 하지 못하여
하루하루 해가 져가는 하늘끝을 바라보며 무척 슬펐다
여러 날 미루다 그렇게 닿게 되면
가슴 활짝 열어 안아주는 고향
확 트인 뜰이 보이는 거기
영원히 당신 머문 자리
하늘, 바다 그 어디든
둥둥 끝없이 흘러갈 수 있어 좋은 곳
이제 조금 잊을만하겠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